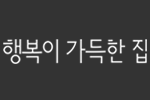- 2012년 3월호 2012 메종&오브제 리포트 올해 인테리어 트렌드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행복> 편집부가 지난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2012년 S/S 메종&오브제 전시 현장을 방문 취재했다.
- 2012년 3월호 생명 있는 것들의 봄! 돌돌돌 시내 가까운 언덕에 말 한 마리 노닌다. 덤불 속 풀꽃 향에 코 박은 것인지, 이파리들 사분대는 장난에 간지러워, 간지러워 웃는 것인지…. 우람하고 매무새 빼어난 말보다는 이렇게 짧은 다리, 오동보동한 허리의 조랑말이 좋다. 이 조랑말이 풀밭 위를 거닐면 방울 소리 떨어진 곳마다 꽃이 피어날 것만 같다.화적 떼처럼 올라오는 봄기운에 가슴
- 2012년 3월호 마흔에 찾은 요리 인생 베이커리 전문가 공은숙 씨는 마흔이 될 때까지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 경험 없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 그런 그가 베이커리를 배우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베이커리 스튜디오 ‘슈크레’의 대표이자 소문난 요리 선생님이며 홍차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빵으로 찾은 두 번째 인생의 주인공, 베이커리 전문가 공은숙 씨를 만났다.
- 2012년 3월호 한국 주거 문화의 트렌드 산실,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사반세기 역사에 빛나는 <행복이가득한집>은 매년 봄, 국내 최대 인테리어 전시회 ‘서울리빙디자인페어’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주거 문화를 이야기해왔습니다. 올해 18회를 맞이하는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오는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전시장으로 향하기 전, 그동안 서울리빙디자인페어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한층 넓은 안목으로 전시
- 2012년 3월호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온 고요한 아침의 남자 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큰 날숨으로 마음을 비우고 긴 들숨으로 평화를 마신다. 모든 요소를 지운 채 여백과 정적만 남긴 사진 앞에서. 세계적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지닌 작가이자, 한국에도 수많은 경배자를 둔 마이클 케나가 한국을 찾았다. 이번엔 고요한 아침의 흔적을 담은 사진과 함께다. 전시 제목도 ‘고요한 아침’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이 고요한 남
- 2012년 2월호 가족 간 불화를 피하는 방법 “바른 매너는 사회생활의 안정제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문학가인 필립 체스터필드가 매너에 대해 한 말이다. 사회생활을 하며 내가 필요해서 혹은 상대가 어려운 사람이기에 매너를 지키는 건 쉽다. 그에 비해 가족 간 매너는 어떠한가. 20~50년에 이르는 긴 시간을 함께하는 관계여서 잘해줘야지 하다가도 자꾸 뒤로 미루는 안일한 마음이 생겨
- 2012년 2월호 만년필 글씨에선 잉크빛 바다가 출렁인다 어떤 사람들은 성능만으로 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펜이란 지식인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좋은 펜을 갖는 것은 훌륭한 필체를 지닌 것만큼이나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는 징표와도 같지요. 적어도 교양인들의 세계에서는 말입니다.
- 2012년 2월호 타로 점 쳐주는 아빠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느닷없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한두 번 고집 피우다 꺾일 기세도 아니었다.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친구가 정식 축구 선수로 뛰고 있다며 자기도 그쪽으로 전학을 시켜달라고 제 엄마를 조르기 시작했다. 그때 아이의 눈빛은 가히 죽음마저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함으로 가득 찼다.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는 학교를 놔두고, 30분가량 버스로
- 2012년 2월호 놋그릇 가지런히 서촌의 고즈넉한 정취와 어딘지 닮은 듯한 놋그릇 가게 ‘놋:이’를 찾았다. 놋쇠 소리의 울림이 그리워 대를 이어 유기 공방을 운영하는 이경동 씨와 좋은 놋그릇으로 대중과 소통하겠다는 아내 김순영 씨의 ‘놋’ 이야기.
- 2012년 2월호 사는 날은 다 꽃다운가 고독이 머무는 겨울 숲처럼, 재앙이 지나간 폼페이의 폐허처럼 마른 식물로 가득하다. 이 세상 꽃이 아닌 것 같은 검은 꽃무리가 한데 모여 검은 들판을 이룬다. 그 들판을 따라 금욕적으로 걷는데, 어이구머니! 그 비탄스러운 꽃이 어느새 찬란하게 붉은 꽃으로 보인다. 어찌 된 일일까. 찬찬히 살피니 종잇장처럼 얇은 꽃 조각이 한쪽 면은 검은색으로, 한쪽 면은
- 2012년 2월호 혹시 나도 치매 아닐까? “이틀 걸러 감는 머리, 어제 감았나 그제 감았나 고심해도 기억이 안 나 결국 다시 감고 말았다. 아까 담근 녹차를 마시려고 보니 티백은 찻잔 밖에서 보송보송하게 누워 있고, 네모난 종이 쪼가리만 찻물 위를 헤엄치고 있다. 혹시 나도 치매 아닐까? 살아야 할 날이 훨씬 많은데, 이러다 나를 놓치면 어떡하지…. 내 뇌가 수명을 다한 건가?” TV 드라마 &l
- 2012년 2월호 인생 2막은 온다,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온다! 인생 2막을 꿈꾸나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평생 행복한 직업을 찾고 있나요? 직장을 떠나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요? 아니면 학업이나 나만의 새로운 일을 찾고 싶은가요? 2012년 1월 <행복>은 1천3백42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12년 <행복>에서 준비하는 ‘3545 인생 2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