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07월 가끔은, 일부러 느리게 살아보자 (서명숙 이사장)
-
서명숙 씨의 세 번째 글
고향 서귀포를 떠난 지 30여년 만에 오직 길을 내기 위해 귀향한 것은 지난 2007년 여름.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렀다. 다른 이들에게 서귀포는 ‘한국 제1의 여행지’이자 ‘올레 코스 중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지만 내게는 일상의 공간이다. 어릴 적에도 ‘우리 고향 사람들은 어지간히 느려터졌다’ 생각했지만 눈이 팽팽 돌아가게 복잡한 서울살이와 분초 단위로 움직이던 기자 생활을 너무 오래한 탓일까? 다시 돌아온 서귀포의 시계는 한없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사람들은 특유의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휘적휘적 시내를 떠다니고,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디 감시니’ 하면서 길에서 한참 안부를 묻곤 했다. 그야말로 ‘슬로 시티’ 그 자체였다. 여유롭게, 느리게 살고 싶어 언론사를 때려친 나였지만 고향 사람들의 느림에 제대로 적응하기 힘들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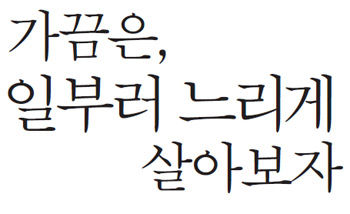 올봄에 겪은 ‘보일러 기름 배달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 여전히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춘삼월, 비까지 갑자기 쏟아지는 날 내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에 후배 몇몇이 모처럼 놀러왔는데 하필이면 기름이 똑 떨어져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았다. 부랴부랴 단골 기름집에 전화했더니, 비가 와서 배달할 수 없단다. 후배에게 내가 물었다. “비 오면 기름이 젖나? 배달 안 된다는데?” 과학 기자를 지낸 후배가 어이없다는 듯 자기가 다른 가게로 전화를 해본단다. 호기롭게 전화를 건 후배도 몇 마디 주고받더니 맥없이 전화를 끊었다. “점심시간이라서 배달 안 된대.” 다시 처음 가게로 전화를 했더니 주인장이 이번엔 아예 역정을 냈다. “아주머니라면 비오는 날 배달하고 싶으쿠광?”
올봄에 겪은 ‘보일러 기름 배달 사건’도 그중 하나였다. 여전히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춘삼월, 비까지 갑자기 쏟아지는 날 내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에 후배 몇몇이 모처럼 놀러왔는데 하필이면 기름이 똑 떨어져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았다. 부랴부랴 단골 기름집에 전화했더니, 비가 와서 배달할 수 없단다. 후배에게 내가 물었다. “비 오면 기름이 젖나? 배달 안 된다는데?” 과학 기자를 지낸 후배가 어이없다는 듯 자기가 다른 가게로 전화를 해본단다. 호기롭게 전화를 건 후배도 몇 마디 주고받더니 맥없이 전화를 끊었다. “점심시간이라서 배달 안 된대.” 다시 처음 가게로 전화를 했더니 주인장이 이번엔 아예 역정을 냈다. “아주머니라면 비오는 날 배달하고 싶으쿠광?”
후배들은 모두 서울에서 내려온 ‘올레 이민자’들이었고, 나 역시 육지에서 산 세월이 더 많은 ‘경계인’이었다. 다들 흥분해서 ‘시골 동네의 서비스 마인드 부재’를 규탄하는데, 인도에서 2년쯤 살다온 후배 은주가 다르게 반응했다. “이게 훨씬 인간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인도 사람들도 좀 그렇거든요. 처음엔 답답했지만 나중엔 우리가 사소한 일에 너무 목숨 거는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배달 직원의 입장을 생각하는 주인, 우리 입장에선 불친절이지만 인간적이지 않나요?” 은주의 다른 ‘시각’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했고, 덕분에 우리가 처한 불쾌한 상황은 ‘재미있는 문화 충격’으로 치환되었다.
얼마 뒤에 ‘15분 내 배달’ 시스템 때문에 과속을 하다가 사망한 한 피자 배달원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고객 만족과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빨리빨리’ 사회가 낳은 비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서귀포 기름가게 주인의 태도를 더 깊이 긍정하게 되었다.
‘빨리빨리’ 문화가 압축적인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인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의 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다.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끔은 의식적으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래서 난 가끔씩 청소기를 놔두고 비질과 손걸레질을 하거나 세탁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 손빨래를 하곤 한다. 손걸레질은 내가 사는 공간을 음미하게 만들고, 손빨래는 내가 입던 옷과 대화하게 만든다.
수돗물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한여름, 한바탕 땀을 흘리며 손빨래를 하고 난 뒤에 욕조에 물을 받아 좍좍 끼얹고 나면, 비로소 ‘나는 인간이다’라는 생생한 느낌을 받는다. 때로는 느림이 빠름보다 더 큰 행복감을, 노동이 휴식보다 더 큰 풍요로움을 준다는 것을 너무 잊고 지내는 건 아닐까.
‘길 내는 사람’ 서명숙 이사장은 글이라는 도구로 사람들 마음에 ‘일 내는 사람’ 같습니다. 이 짧은 글을 읽었을 뿐인데도 한바탕 땀 흘리며 손빨래질, 손걸레질 하고 싶어 마음이 근질거리시죠? 지금 이 순간부터 좀 늦추고, 숨 고르고 살면서 ‘나는 인간이다’라는 느낌을 갖고 싶어지시죠? 저도 이 글을 읽고 나니 오늘만큼은 “아주머니라면 비 오는 날 배달하고 싶으쿠광?” 내지르는 기름집 주인에게 면박 당해도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 제 마음에도 일 냈군요.
로그인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