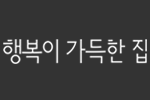나무의 물성과 흐름을 존중하며 자연과 인간, 재료와 손길 사이의 조화를 탐구하는 김희찬 작가의 작품과 손이라는 신체 언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구세나 작가의 작품.
나무의 물성과 흐름을 존중하며 자연과 인간, 재료와 손길 사이의 조화를 탐구하는 김희찬 작가의 작품과 손이라는 신체 언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구세나 작가의 작품.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기간 9월 4일~11월 2일
장소 문화제조창(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모든 것이 빠르게 소비되고 잊히는 시대에도 공예는 고유한 리듬을 지켜왔다. 나무를 다듬고, 흙을 빚어 구우며, 실을 엮는 과정 속에서 느린 시간이 쌓이고, 그 끝에 비로소 형태가 완성된다. 공예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시간을 담아내는 방식이며,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언어가 된다. 사실 공예는 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밥을 담는 그릇, 몸을 감싸는 옷, 집을 이루는 가구처럼 공예는 언제나 일상의 한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대상작인 이시평 작가의 ‘Log 일지日誌’는 금속 기둥 속 쇳가루의 움직임이 내는 소리로 청각 경험을 선사한다.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대상작인 이시평 작가의 ‘Log 일지日誌’는 금속 기둥 속 쇳가루의 움직임이 내는 소리로 청각 경험을 선사한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는 ‘세상 짓기’라는 주제로, 바로 이 힘을 다시 묻는다. 전 세계 72개국, 1천3백여 명의 작가가 응답한 장을 펼쳤다. 공예를 오래된 생활 도구나 전통의 재현이 아니라, 오늘의 사회와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전시는 공예를 문명의 출발점으로 재조명한다. 처음으로 마주하는 섹션인 ‘보편문명으로서의 공예’. 무형문화유산 장인과 협업한 공간 ‘바람과 달, 술과 가야금, 시와 그림 사이로 흐르는 멋과 흥-풍류’에서는 공예가 기술을 넘어 삶과 예술, 감각을 이어온 매개였음을 드러낸다. 생활과 예술이 나뉘지 않던 시절의 공예적 감각이 오늘의 시각 속에 소환된다. 이어지는 ‘탐미주의자를 위한 공예’에서는 촉각적 경험이 중심에 놓인다. 김희찬 작가의 나무 작업은 인두 열에 반응하는 재료의 유기적 변화를, 구세나 작가는 손의 움직임 자체를 매개로 한 인간 존재의 본질적 질문을 드러낸다. 압델나세르 이브라힘Abdelnasser Ibrahim의 종이는 자연의 결을 닮으며, ‘재료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물음을 건넨다. ‘모든 존재자를 위한 공예’는 사회적 응답으로서의 공예를 보여준다. 흙, 나무, 섬유, 금속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사회와 문명의 구성 요소로 등장한다. 수지 비커리Susie Vickery는 인도의 여성 직조가들과 함께 직물을 짜며 기후 위기의 이야기를 직조했고, 카티야 트라불시Katya Traboulsi는 전쟁의 잔해를 수공예를 통해 치유의 장면으로 변환시켰다. 리위푸Li Yupu의 유리 비닐봉지는 사물의 맥락을 전복하며, 우리가 익숙하게 소비하는 물질의 의미를 재고하게 만든다. 마지막 섹션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예’에서는 공동체와의 접점을 강조했다. 사막 여성들의 직조, 쌀을 매개로 한 한국의 실험, 산불로 소실된 고찰을 지팡이로 되살린 작업까지 장인과 시민 및 예술가와 아마추어가 함께 얽어낸 공예적 과정이 펼쳐졌다.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곧 관계를 체험하는 일이 되었고, 공예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손길임을 실감하게 한다.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엮음과 짜임>은 한국·인도 작가 여덟 팀의 신작과 전통 섬유 30여 점으로 섬유의 전통과 현대적 재해석을 잇는다. 카이무라이, ‘내 모든 기도에 대한 답은 내가 결코 묻지 않았던 질문 속에 있다’, 2025.

옻칠과 유화, 수목, 수채, 파스텔 등 기법을 혼합한 채림 작가의 ‘아리랑 칸타빌레’.
특별전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 엮음과 짜임〉은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공예의 확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장연순 작가의 설치 작품이 만들어낸 고요한 호흡, 유정혜 작가의 베일, 홍영인과 고소미의 협업은 서로 다른 맥락이 교차하며 하나의 결을 이루는 장면을 연출한다. 인도의 직조와 영국 휘트워스 미술관의 소장품이 더해진 장면은 국경을 넘어선 직물 같은 풍경을 완성한다. 주빈국 태국관의 〈유연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는 또 다른 리듬을 품고 있다. 불교 의식의 천으로 구성한 윗 핌칸차나퐁Wit Pimkanchanapong의 미로를 걷는 경험은 ‘속도의 시대’와는 다른 시간성을 몸으로 느끼게 했다. 이곳에서 공예는 물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제안하는 언어다.

리위푸 작가는 대량생산한 비닐을 유리로 재해석해 물질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태국관의 <유연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는 시간에 대한 의미를 공예로 풀어냈다.
전시를 모두 관람하고 나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공예는 더 이상 생활의 도구나 미적 대상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 사물과 인간, 인간과 자연, 지역과 세계를 이어주며 세상을 다시 짓는 언어로 기능하는 공예.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는 이 언어가 오늘의 위기를 넘어설 힘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행복> 10월호를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E-매거진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