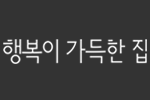지난 4월 이사 온 사무실에서 만난 백에이어소시에이츠 안광일·박솔하 소장
백에이어소시에이츠가 지난봄, 1980년대에 지은 3층 규모 건물을 고쳐 사무실을 옮겼다. 사옥은 호랑이 석상의 환대, 뒷마당으로 돌아 들어가는 동선, 대나무 숲 전이 공간, 낮은 조도까지 그들의 무드가 곳곳에 담겨 있다. 1층 카페도 직접 운영을 준비 중인데, 이곳은 그간 인연을 맺은 클라이언트를 소개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카페 라메르 판지의 원두로 커피를 만들고, 요가 명상 센터 밀밀아의 매트나 굿즈 같은 아이템을 함께 전시한다. 윤현상재에서 작품전을 열었을 때도 그들은 클라이언트와 함께했다. 스테이에서는 클리닉에서 개발한 음료를 제공하고, 클리닉에서는 손님에게 스테이를 소개하도록 연결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단순히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라 느껴질 정도다.
건축주라는 존재는 그들이 만드는 공간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다. 트렌드나 디자이너의 철학보다 주인공이 될 사람의 이야기에 가장 집중한다. 이를테면 향심재의원은 ‘잘 먹으면 병이 나지 않는다’는 의사의 철학에 맞춰 밥 짓는 의원을 테마로 삼고, 외벽에는 쌀가마를 연상시키는 볏짚을 둘렀다. 건축주는 콘셉트부터 외장재까지 자신의 치유 철학으로 이어진 병원을 갖게 됐다.
건축주와 상생을 고민하고 그들의 일부가 되는 공간을 짓는 것. 그 뿌리에는 백에이어소시에이츠에서 만든 장소가 오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저희가 작업하는 공간이 오랫동안 사랑받으면 좋겠어요. ‘건축주의 이야기로 지은 공간이라면 더 애착을 갖고 보살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 여러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동안 안광일·박솔하 소장은 그들이 공간 디자이너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건축가라는 표현은 너무 장황하고, 그저 공간 디자이너로 행할 수 있는 건축을 해왔다고 말이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건축주가 필요로 한다면 모르는 분야라도 시도해보고, 공간에 어울리는 결과물이 목표라면 조경도 브랜딩도 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건축가와 디자이너를 가르기 전에 이러한 태도가 공간을 만드는 이들이 갖춰야 하는 자질 아닐까. 건축주라는 사람을 바탕으로 공간의 가장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어쩌면 더 건강하고 적정한 건축물을 만드는 묘책이었을지도 모르겠다.
100A associates recently moved into a renovated 1980s three-story building that reflects their distinct sensibility—from a tiger statue at the entrance to a bamboo grove transition and subdued lighting. The first floor will soon open as a café, doubling as a platform to showcase long-time collaborators like Café La Mer Panji and meditation center Milmila. Their projects often extend into partnerships: at Stay, they served drinks developed by a clinic, which in turn introduced Stay to its patients. “Client” feels too narrow; they are building a community orbiting around their work.
The client is always at the very center of the spaces they create. More than trends or the designer’s philosophy, the focus lies on the story of the person who will truly inhabit and own the space. For example, Hyangsimjae embraced the doctor’s belief that “good food prevents illness” by adopting the theme of a dining-oriented clinic, with its exterior wrapped in rice straw to evoke the image of a rice sack. From concept to façade, the architecture became a direct extension of the client’s own healing philosophy.
100A associates aims to create spaces that live alongside their clients and endure over time. “If a space grows from the client’s story, they’ll care for it more,” say directors An Kwang-il and Park Sol-ha, who describe themselves simply as spatial designers. For them, titles matter less than attitude: if the client needs it, they will try anything—from landscaping to branding—so long as it serves the space. Beginning with the client at the core, they suggest, may be the key to building more lasting and meaningful architecture.
백에이어소시에이츠
2013년 안광일·박솔하 소장이 설립한 공간 디자인 사무소. 건축디자인부터 브랜딩과 제품 디자인까지 포괄적인 영역을 작업하며, 주거 공간과 상업 공간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아이코닉 디자인 어워드, 골든스케일 디자인 어워드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다. 100a.kr

 문가화령 부산 가덕도에 위치한 세컨드 하우스 겸 스테이. 바다를 향해 탁 트인 대지에 여백처럼 지은 건축물이 자리한다. 1층 퍼블릭 공간은 경계 없이 이어지고, 사적 공간을 독립적으로 배치한 2층에서는 평온한 사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집주인이 특별한 날마다 기념하며 수집해온 작품을 어울리도록 배치해 스테이이지만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듯한 기분이 든다.
문가화령 부산 가덕도에 위치한 세컨드 하우스 겸 스테이. 바다를 향해 탁 트인 대지에 여백처럼 지은 건축물이 자리한다. 1층 퍼블릭 공간은 경계 없이 이어지고, 사적 공간을 독립적으로 배치한 2층에서는 평온한 사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집주인이 특별한 날마다 기념하며 수집해온 작품을 어울리도록 배치해 스테이이지만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듯한 기분이 든다.

 무곡 전라북도 무주 심곡리의 깊은 골짜기 속 1만㎡ 규모의 대지에 자리한 웰니스 리조트. 1층 직원실과 리셉션, 숙박객에게 대여하는 다실이 있는 리셉션동과 11개 객실동으로 이루어진다. 타워 형태의 리셉션동은 무곡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연을 조망하는 장치다. 3층 다실에서는 커다란 가로 창을 통해 시시각각 달라지는 산의 풍경을 파노라마로 체험할 수 있다.
무곡 전라북도 무주 심곡리의 깊은 골짜기 속 1만㎡ 규모의 대지에 자리한 웰니스 리조트. 1층 직원실과 리셉션, 숙박객에게 대여하는 다실이 있는 리셉션동과 11개 객실동으로 이루어진다. 타워 형태의 리셉션동은 무곡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연을 조망하는 장치다. 3층 다실에서는 커다란 가로 창을 통해 시시각각 달라지는 산의 풍경을 파노라마로 체험할 수 있다.
 와타 한라산과 오름이 어우러진 제주 봉성리 마을에 들어선 스테이. 주변 지형을 닮아 가로로 긴 형태의 낮은 집을 짓고, 제주의 고전적 풍경을 곳곳에 들였다. 현무암과 짙은 나무, 은은하게 빛을 들이는 대나무 발과 패브릭으로 마감한 실내 공간은 소박한 미감을 전하며 사색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준다.
와타 한라산과 오름이 어우러진 제주 봉성리 마을에 들어선 스테이. 주변 지형을 닮아 가로로 긴 형태의 낮은 집을 짓고, 제주의 고전적 풍경을 곳곳에 들였다. 현무암과 짙은 나무, 은은하게 빛을 들이는 대나무 발과 패브릭으로 마감한 실내 공간은 소박한 미감을 전하며 사색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준다.
 이재 악기를 다루고 작곡하는 아티스트의 자택 겸 작업실. 건축주의 세계를 깊이 관조하며 그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로 탄생한 집은 높은 외벽과 최소한의 창, 어두운 전이 공간 등 극도로 절제된 모습이다. 주로 맨발로 생활하는 집주인이 자연과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층마다 마루와 석재, 타일 등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했다.
이재 악기를 다루고 작곡하는 아티스트의 자택 겸 작업실. 건축주의 세계를 깊이 관조하며 그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로 탄생한 집은 높은 외벽과 최소한의 창, 어두운 전이 공간 등 극도로 절제된 모습이다. 주로 맨발로 생활하는 집주인이 자연과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층마다 마루와 석재, 타일 등 서로 다른 재료를 사용했다.

 쿼크 커피 바 한국의 커피는 아픈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나 1백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속에 깊이 자리매김했다. 더 이상 서구 문화가 아닌 우리만의 공간 미학이 담긴 장소에서 커피 미학을 사유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담아 한국의 멋과 서구의 맛 두 가지 상반된 문화를 접화하는 카페를 디자인했다. 커피에 대한 진정성을 짙은 미감으로 표현한 에스프레소 바와 로스팅실, 옻칠 한지와 삼베 등 자연 소재로 마감한 손님 공간에는 한국의 졸박미가 그윽히 담겨 있다.
쿼크 커피 바 한국의 커피는 아픈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나 1백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속에 깊이 자리매김했다. 더 이상 서구 문화가 아닌 우리만의 공간 미학이 담긴 장소에서 커피 미학을 사유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담아 한국의 멋과 서구의 맛 두 가지 상반된 문화를 접화하는 카페를 디자인했다. 커피에 대한 진정성을 짙은 미감으로 표현한 에스프레소 바와 로스팅실, 옻칠 한지와 삼베 등 자연 소재로 마감한 손님 공간에는 한국의 졸박미가 그윽히 담겨 있다.
“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영역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생각하는 생활상을 공간이라는 언어로 시각화하는 작업’이더라고요. 그 방식을 깨우치는 것에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백에이어소시에이츠에서 공간에 접근하는 태도나 방법론은 무엇에 바탕을 두나요?
안광일 박솔하 소장과 저는 공간 디자인 회사에서 6~7년 정도 일하다가 독립했어요. 그때 건축 프로젝트를 한 게 바탕이 되어 개소 후에도 작업이 이어졌고, 지금은 백에이어소시에이츠를 건축가로 아는 분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은 건축가와 조금 다릅니다. 건축가가 건축에 자신의 철학을 담는다면 저희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준다는 태도로 작업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통에 더 집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박솔하 저희가 하는 일이 공간인지 건축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다 보면 스타일링이나 브랜딩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그때도 일하는 태도는 동일합니다. 직원들에게도, 저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데, 결국 ‘누군가가 생각하는 생활상을 공간이라는 언어로 시각화하는 작업’이더라고요. 그 방식만 깨우치면 영역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이언트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간을 디자인하는 지금의 방법론은 어떻게 형성되었나요?
안광일 방법론을 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저희에게 익숙한 프로세스로 건축에 접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에 가까워요. 건축가가 법규와 콘셉트에 맞춰 전체 형태부터 디자인한다면 저희는 실제로 쓰는 공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관의 형태가 마지막에 완성되기도 해요. 또 건축은 대개 설계가 끝난 뒤의 과정을 시공사에서 담당하지만, 저희는 공사까지 직접 진행하다 보니 건축주와 소통하는 기간이 길어요. 초반에는 디자인과 취향을 알게 되는 정도라면, 시공 단계까지 이어질 때는 디테일하게 그들의 생각을 듣게 돼요. 손잡이 하나도 더 맞춰서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주거 공간과 스테이를 주로 작업합니다. 두 공간을 설계하며 느낀 각각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박솔하 주거 공간은 클라이언트를 깊이 탐구하는 재미가 있어요. 어린 시절 모습부터 사소한 습관, 어떤 생각을 갖고 일하는지, 아이는 어떻게 키웠는지까지 한 사람의 세계를 낱낱이 파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되어보지 못한 것, 해보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기분이랄까요. 반면 스테이는 브랜딩으로 연결하다 보니 좀 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스테이의 매력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서 작업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스테이를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나요?
안광일 왜 스테이를 하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요. 스테이 시장은 2~3년 전부터 이미 포화 상태라 만약 수익만을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권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과 결부된 일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제주 스테이 시호루의 건축주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서울에서 제주로 이사 가면서 건축을 의뢰했어요. 주택에서 살아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으니 일단은 아파트에 살면서 집을 한 채 지어보고, 스테이로 운영하다가 여차하면 우리도 좀 살아보자고 생각한 거죠. 부산 가덕도의 문가화령은 건축주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매일 바쁘다 보니 주말에 갑자기 시간이 났을 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놓은 다음 가족이 놀고 싶을 때 쓰고, 비어 있을 때는 스테이로 운영하기로 했어요. 두 경우 모두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공간이고, 수익은 부가적인 목적에
가까운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테이도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공간이 되겠네요.
박솔하 맞아요. 어떤 장소의 오롯한 이야기는 주인공인 사람으로부터만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만의 이야기와 철학으로 운영하는 스테이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결국 이상적인 집과 스테이는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의 스테이는 또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안광일 무곡을 설계할 때는 스테이 시장이 포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국내 펜션부터 스테이, 해외 호텔까지 주목할 만한 사례를 소비 가치 기준으로 구분하고 분석해보는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는 펜션에 해당하는 기능적 가치예요. 펜션에서는 계곡에서 놀고 고기 구워 먹은 다음에 자고 돌아오면 만족도가 높죠. 2단계인 사회적 가치부터는 스테이의 영역입니다. 펜션과 달리 안에서 사진도 찍고 공간도 즐겨요. 브랜딩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3단계 감정적 가치는 여기에 조식이나 수영장 같은 서비스가 더해집니다. 마지막이 진귀적 가치인데, 앞으로의 스테이는 이 영역을 노려야 해요.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하는 것입니다. 무곡은 이 진귀적 가치에 집중했어요. 스테이가 아니라 리트리트 리조트로 기획해 호텔 수준의 어메니티와 음료 서비스를 갖추고, 별도의 리셉션 건물에서 운영하는 명상·다도 같은 프로그램을 자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에이어소시에이츠의 다음 10년, 20년은 어땠으면 하나요?
안광일 요즘에는 가끔씩 제가 사무실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에이어소시에이츠가 하는 일에 비해 제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 속도를 좀 더 맞춰가면서 잔잔히 건강하게 작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백에이어소시에이츠 일 잘한다”는 이야기를 오래 듣고 싶어요. 디자인이든, 운영이든 안정적으로 성장해나가는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행복> 9월호를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E-매거진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