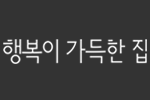에이코랩의 사무실이었다가 정이삭 소장 부부의 집이 된 녹색박공집. 2층 거실에서 가파른 경사 지붕이 만들어낸 탁 트인 공간감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에이코랩의 사무실이었다가 정이삭 소장 부부의 집이 된 녹색박공집. 2층 거실에서 가파른 경사 지붕이 만들어낸 탁 트인 공간감을 한껏 느낄 수 있다.
가루이자와의 별장을 닮은 건축가의 사무실
“이 동네엔 유행이든 예술이든 주장이든 무언가 생산해내는 사람들의 주거지가 골목골목 들어차 있다. 논현·학동·압구정에 없는 훈김, 느슨함, 안정감은 그런 데서 온다.”(〈행복〉 2024년 12월호 라이프&스타일), “연희동은 한 박자 늦는 느낌이었다. 오래된 나무와 담벼락이 시간을 앉히고 있달까.”(〈연희동 러너〉, 임지형)

물성의 조화가 돋보이는 주방. 마음에 둔 석재를 구입해 주방 상판으로 사용했다.
연희동은 창작자에게 제2의 고향 같은 동네다. 도심이지만 섬처럼 고립되어 주변으로부터 멀어질 자유를 주는 곳. 도시의 변화도, 사람의 걸음도 느리게 흐르는 이곳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갈 장소를 찾는 사람들의 정박지가 되어왔다.
 침실 통창을 통해 바라다보이는 마당과 담장. 대나무의 검은 줄기가 진한 녹빛으로 물든 담장과 차분하게 어우러진다.
침실 통창을 통해 바라다보이는 마당과 담장. 대나무의 검은 줄기가 진한 녹빛으로 물든 담장과 차분하게 어우러진다.
연희동 생활 5년 차인 에이코랩건축사사무소(이하 에이코랩) 정이삭 소장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2013년 에이코랩을 설립한 이후, 관습처럼 지속되는 일상 속 공간의 새로운 쓰임과 형상을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죽은 아까시나무로 오래된 주택을 받치는 기둥을 세우고, 시장의 오방색 차양막을 파라솔로 변신시킨다. 아파트에 주택의 위계를 도입해 처마 아래 툇마루나 사랑채를 만들기도 한다. 올해 젊은건축가상 심사 위원이었던 건축가 손진은 그들의 건축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깊이 관여하며, 치밀하고 섬세하게 대응하는 과정이 모여 건축이 된다. 특유의 감수성이 모든 과정에 개입해 익숙한 풍경을 생경하게 재창조한다”고 소개했다. 최근 젊은건축가상과 더불어 여러 건축상을 수상하며 주목받는 건축사무소이기도 하다. 그와 에이코랩 식구들은 차분하고 조용한 별서別墅를 찾아 2021년 연희동에 왔다.
 집에는 시간이 담긴 물건이 곳곳에 자리해 있다. 거울은 철거 예정인 개포동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프로젝트를 하던 중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챙겨온 그곳의 흔적 중 하나다.
집에는 시간이 담긴 물건이 곳곳에 자리해 있다. 거울은 철거 예정인 개포동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프로젝트를 하던 중 사라지는 것이 아쉬워 챙겨온 그곳의 흔적 중 하나다.
“2020년, 사무실을 시작한 후로 거의 7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떠났어요. 그때 혼자 콜롬비아를 여행하면서 소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를 읽었는데, 여름이 되면 별장으로 사무실을 옮겨 차분히 일하는 소설 속 건축가의 모습을 보며 많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애써 다작을 하거나 사회적 교류에 급급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가도 괜찮겠다고요. 그러면서 어딘가 도시와 떨어진 곳에서 차분하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여름날, 그는 궁동산 아래 주택단지에서 소설 속 가루이자와 별장을 꼭 닮은 지금의 녹색박공집을 만났다.
“적당히 사적이고 적당히 화려한 균형감이 지금의 흥미로운 연희동을 만들었어요. 오래된 정취를 간직한 집들이 자리를 지키며 동네를 유유히 즐길 수 있는 속도로 조절해줍니다.”

높은 층고 덕분에 만들어진 다락은 누워 있으면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장소다. 왼쪽에 살짝 보이는 방은 정이삭 소장의 서재.
1971년 지은 집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 얽힌 이야기를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그 자체로 흥미로운 구석을 가득 품고 있었다. “한쪽으로만 아주 가파른 경사 지붕이 길가에서 만나는 이 집의 첫인상이에요. 이끼가 자라 있는 지붕면이 집의 정면이 되는 묘한 형태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남향의 빛을 받기 위해 옆집과 최대한 거리를 띄워 마당을 두고,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지도록 경사 지붕을 만든 것, 길가에서 보이는 집의 파사드를 지붕면으로 대체한 것까지 그때의 기술과 기법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였어요.”

거실에서 보이는 2층 공간 일부는 사무실로 고치면서 증축했다.
외관은 여기저기 새시를 덧대어 인위적으로 확장한 공간을 정리해 집의 원형을 되찾는 정도로만 손을 댔고, 내부는 벽의 배치만 유지하고 완전히 새로 고쳤다. 경사 지붕의 탁 트인 층고를 살리지 못한 채 평천장으로 막혀 있던 천장 구조체를 모두 뜯고 시원한 공간감을 확보한 것은 레노베이션의 가장 큰 성과였다. 적막한 기운이 감돌던 집은 건축가의 손길을 거쳐 잃어버린 빛과 조망을 되찾았다. 바닥과 계단, 가구는 화이트 오크, 벽은 하얀색 페인트, 지붕은 옹이가 없는 소프트 우드로 마감해 단정해진 집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었다.
<행복> 11월호를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E-매거진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