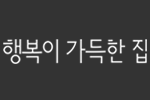‘시골’은 도시에 지친 사람들의 문을 언제나 두드리는 존재다. ‘이도離都’라는 단어에는 약간의 설렘마저 느껴진다. 혼잡한 도로, 빽빽한 사람들, 치이는 일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유토피아 같다고나 할까. 전원주택, 농막, 세컨드 하우스, 워케이션 등 도시와 시골 사이의 줄타기는 그간 여러 방향으로 이어져왔다. 최근에는 아예 도시 밖으로 삶의 무대를 옮긴 이들의 소식도 들려온다. 도시의 강퍅한 인심을 피해 가평으로 떠나 개 두 마리와 사는 편집 디자이너(2025년 6월호), 양평에 함께 집 짓고 서울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죽마고우 건축가(2024년 8월호), 이천의 작업실 겸 집에 새로이 뿌리내린 문화재 복원가(2023년 8월호)까지. 그들은 도시와 완전히 연을 끊지는 않되 소도시나 시골에서 다른 삶을 모색했다. 그들은 무엇을 좇아 그곳으로 갔을까, 거기에서 과연 원하던 것을 얻었을까? 그다음 이야기가 궁금했다. 우리가 원하는 삶 역시 그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편집팀은 성격이 조금씩 다른 시골집 사례를 모았다. 평일과 주말을 다른 집에서 보내는 5도2촌러, 스테이라는 새로운 업에 도전하는 부부 등 다양한 삶의 꼴을 찾아갔다.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짧게나마 살펴보며 깨달은 것은 시골에 산다고 해서 도시에서 누리던 것을 포기할 필요도, 도시의 삶을 지속하면서 시골이 주는 힘을 놓칠 필요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어느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를 버려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서울에 집을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지방에 세컨드 홈을 마련해도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세컨드 홈 특례 지역’에 강릉·속초·경주 등 아홉 개 지역을 새로 추가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제도는 시골에 집을 짓거나 고치는 이에게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6개월까지 농촌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있기는 하나 2023년부터 도쿄에서 시골로 이주하는 가족에게 자녀 한 명당 약 1백만 엔을 지급하고 있다. 레노베이션 전문 회사 루비스Roovice는 빈집을 소유주의 비용 부담 없이 고치고, 임대주택으로 일정 기간 비용을 회수한 뒤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가리아게Kariage’ 프로젝트를 통해 교외의 빈집 문제와 근교로 떠나는 이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동시에 기여하는 중이다. 특집 말미에는 국내 듀얼 라이프 플랫폼을 소개했는데, 일본만큼이나 흥미로운 시도가 도입되고 있었다.
프롤로그 도시 인류의 행복한 시골 탐사기
사례
프리랜서 사진가와 N잡러 농부의 시골살이 _ 박혜정·장정우 부부의 홍성 패시브 하우스
게스트와 호스트가 함께 머무는 집 _ 김민재·이도훈 부부의 부산 주옥홈
직장은 도시에, 집은 시골에 _ 김정주·박지민 부부의 양평 딩가딩가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시골에서 _ 장기주·장경희 부부의 홍천 세컨드 하우스
정보 듀얼 라이프를 위한 첫걸음
<행복> 10월호를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E-매거진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