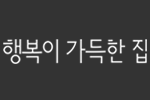최용준, '서울 아파트', 2020.
최용준, '서울 아파트', 2020.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언제나 나를 기다리던 아파트"가 잠실아파트라는 설은 꽤 믿을 만하다. 작곡·작사가 윤수일이 잠실대교를 건너며 본 아파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밝혔거니와, 1982년 곡 발표 당시 다리 건너 양쪽으로 늘어선 아파트는 잠실 장미아파트(1978년 준공)와 잠실 주공 5단지(1979년 준공)밖에 없었다. 1970년대 초부터 서울시가 '한강 개발, 강북의 인구 분산"이라는 뻔쩍뻔쩍한 캐치플레이즈 아래 시작한 신시가지 개발 사업의 핵심 '잠실 지구 아파트'. 이후 반세기 넘게 대한민국 중산층 옆에서 '언제나 나를 기다'려준 존재가 되었다. 대단지 아파트의 시작은 1972년 3천여 세대 규모로 완공한 압구정 현대아파트. 하지만 잠실 지구 아파트야말로 1974년 첫 입주한 잠실 주공 1단지만 6천5백24세대일 정도로 진정한 의미의 대단지 아파트였다. 계획 단계부터 한강 변 신도시 개념으로 설계해 이후 목동·상계·개포·일원 등 다른 대단지 개발의 모델이 된 점도 이러한 생각에 힘을 싣는다.
1970년대 초 대한주택공사가 반포와 이촌동에 중대형(반포주공 최대 62평, 한강맨션 최대 57평)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 것에 대한 비판이 들불처럼 번지자 '잠실 1~4단지와 잠실 시영으로 대표되는 잠실 지구는 7.5평형부터 19평형까지 소형 아파트를 공급했다. 반대로 슬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마지막 단지인 5단지를 30평형대만 걸설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례만 빼면 잠실아파트는 대단지 시민 주택의 모범과 같은 곳이었다. 엘리베이터 의무 설치를 비껴갈 마지노선-5층짜리_에, 연탄아궁이를 갖춘 복도식 아파트가 그 실증이다.
윤수일이 '아파트'를 발표한 1982년은 아파트 층수가 5층에서 10층대로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했다. 1인당 GDP가 1천9백92달러(1970년에는 2백79달러)로 늘어나면서 드디어 엘리베이터와 기름보일러를 감당할 만한 중산층이 등장한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잠실 지구는 한강 조망권, '세대수 많은 단지가 세 개씩 몰려 있고''초중고 모두 단지 내에 있어서 애들 찻길 안 건너도 학교 다닐 수 잇는 곳' '즐비하게 주차된 차들 때문에 신경전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 곳'과 같은 생활환경 덕분에 본격적인 중산층 선호 단지로 떠올랐다. 또한 2000년대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붐의 중심이 되면서 '엘리트파(엘스·리센츠·트리지움·파크리오)'로 대표되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했다. 현재 70층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도 있다. 잠실지고 아파트야말로 명실상부 한국 아파트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봐야 하는 이유다.
1981년 이상문학상 수상 후 20년간 살던 보문동 한옥에서 잠실 장미아파트로 이사한 박완서 선생이 "겨우 남과 닮기 위해 하루하루를 잃어버렸다"라고 쓴 그 '닮은 방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진화 중일까? '마음은 언제나 대치동에 가 있는 '보모들이 매일 아이들을 대치동-지배계급의 신분과 공간-으로 열심히 나르는 도약대, 은밀하고도 '거대한 상승욕구'를 비추는 얼음판일까?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전 세계적 떼창 한 구절처럼 일상 속 '렌덤 게임'일까? K-아파트 키드가 '영끌'(끌어 모으면 아파트 살 수 있는 영혼이란 게 있을까 싶지만)해 일생에 한 번쯤 뛰어드는 그런 게임 말이다.
<행복> 9월호를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E-매거진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