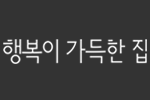영어 표기도 한국어 발음대로 ‘Jeonse’로 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일정기간(보통 2년) 별도의 임대료 없이 거주하는 이방식은 지구상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 일본의 ’이리야세‘(목돈을 맡기는 건 비슷하지만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 안 됨), 이란의 ’란Rahn’(큰 금액 보증금+낮은 월세 지불),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월세는 없으나 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25~40%. 전세 가구의 3~5%에 불과)형태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주택 가격의 50~80%에 이르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남의 집에 얹혀살다 나가는데 왜 돈을 다시 내주나?” “수천에서 수억이라는 큰돈을 뭘 믿고 개인에게 맡기나?” 대다수의 외국인은 이 독특한 제도를 반신반의한다고 한다.
전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세기 후반 개항기이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당시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제도는 사금융 역할을 담당했다. 1970년대 시중 저축 금리가 12%, 은행 대출 금리가 20%로 고금리 상태이다 보니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종잣돈으로 은행에 저축하거나 투자하고, 세임자는 보증금 외에 임대료 없이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 정착한 것. 현재 우리나라 주택 거래 중에서 40%(2020~2022년 연평균 거래량: 1만 호, 전국/수도권 기준 매매 93/44, 전세 133/91, 월세 113/75)에 달하는 비중으로 자리 잡았다. 전세 보증금도 9백조 원을 넘긴 규모다.
2010년대 초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 반전세를 거쳐서 월세로 급격히 대체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2022년 ’빌라왕’ 사태 같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 등을 통해 전세 제도 폐지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립주택 같은 고위험 시장에서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이 가속화되겠지만, 아파트 전세 수요는 정부의 현실적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으로 보고 있다.
<행복> 9월호를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E-매거진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