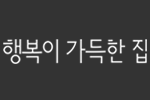미야코지마 공예 시장에서 산 빗자루는 친구가 한옥에 어울린다며 선물해준 것이고, 김홍도의 ‘염불서승’ 영인본은 한옥의 차분한 분위기와 어울려 간송미술관에서 직접 구입했다.
미야코지마 공예 시장에서 산 빗자루는 친구가 한옥에 어울린다며 선물해준 것이고, 김홍도의 ‘염불서승’ 영인본은 한옥의 차분한 분위기와 어울려 간송미술관에서 직접 구입했다.
서울 서촌의 오래된 골목은 이제 젊은 여행자들과 게스트하우스로 북적인다. 하지만 그 안쪽 깊숙이 들어가면 여전히 삶의 숨결이 고스란히 깃든 일상이 존재한다. 좁고 굽은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청운효자동에 이르고, 그 끝자락에서 조용한 틈처럼 자리한 한 채의 한옥과 마주하게 된다. 약 90년 세월을 품은 이곳, 건축가로 일하던 이하경 씨가 머물고 있는 집이다.
 이하경 씨는 이곳에 앉아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하경 씨는 이곳에 앉아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입구를 지나 문을 열면 나무와 흙, 빛이 어우러진 작은 마당이 펼쳐진다. 7자 구조의 단독 한옥은 마당을 감싸듯 자리하고 있으며, 마당과 광倉까지 포함해도 약 15평 남짓한 아담한 규모다. 이하경 씨는 정림건축에서 6년간 주택 설계 실무를 경험했고, 현재는 회사에서 만난 동기와 함께 공간 큐레이션 뉴스레터 ‘소식SOSIC’을 운영하고 있다. 공간 트렌드를 중심으로 도시, 사람, 공간 간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탐구한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거대한 스케일의 공간을 다뤘던 그는 오히려 손이 닿는 작은 공간 안에서 ‘집’의 본질적인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한다.

무인양품의 오크 테이블은 다리 교체로 좌식과 입식을 모두 지원해 공간 활용을 유연하게 해주며, ᄀ자 한옥에서 자연스럽게 공간을 구분한다.
“원래 이사 다니는 걸 좋아해요. 신당동 신축 오피스텔, 망원동 오래된 빌라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살아봤죠. 환경이 확 바뀔 때 자극도 받고, 마음가짐도 새로워지거든요. 물론 기회비용은 크지만요.(웃음)” 수많은 공간을 거쳐온 그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은 퇴사 후 스리랑카에서 보낸 한 달이었다. 자연과 맞닿은 삶은 도시에 있을 때보다 훨씬 가까이 자연을 두고 싶다는 확신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한옥’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에 대한 애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너무 반듯하고 세련된 환경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거친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투박한 질감에서 오히려 멋을 느끼고요. 손때 묻은 것이 주는 정서가 있잖아요. 한옥은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시간이 덧입혀진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세월이 깃든 기둥, 균일하지 않은 창틀, 군데군데 훍이 묻은 벽면 등은 그에게 손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공간 고유의 정체성이자 가치를 드러내는 요소였다.

상부장이 없는 주방에서 하우스하우스 키친랙의 스테인리스 선반 하나만으로도 식기를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입한 반가사유상 오브제는 원래 단순한 장식용 조형물이지만, 향을 피울 때 향꽂이로도 활용한다. 향 연기 사이로 앉아 있는 반가사유상의 모습이 은은하게 어우러지며 공간에 고요하고 명상적인 분위기를 더해준다.
이 한옥은 원래 주방, 거실, 침실의 경계가 없이 이어진 8평 남짓의 원룸 구조였다. 그는 공간 중앙에 책상을 두어 작업과 휴식의 영역을 자연스럽게 구분했다. 모든 가구는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저상형을 택했고, 좌식과 입식 생활 모두에 맞도록 다리를 교체할 수 있는 무인양품 오크 테이블을 선택했다. 또한 기존의 붙박이장은 철거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 공간과 책장으로 재구성했다. 기둥과 창호 및 처마는 그대로 보존하되, 실내 바닥은 기존의 하얀 장판 대신 강마루로 바꿨다. “임대한 집이라 리모델링을 하려면 건축주한테 꼭 허락을 받아야 했죠. 다만 건축주는 제가 건축과 인테리어 일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 터라 전적으로 믿고 맡겨주었죠. 덕분에 마당의 시멘트를 걷어내고 마사토를 깔거나, 실내 마루의 색감을 결정하는 등 과정 하나하나를 자유롭게, 때로는 긴밀하게 논의하며 진행할 수 있었어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MMK의 수납장이 눈길을 끈다. 이곳에는 이하경 씨가 모아둔 LP판이 들어있다.

가든스튜디오 산하의 김정우 소장과 함께 디자인한 마당. 날씨가 좋을 때는 광 위에 올라가 썬탠을 즐기기도 한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들’로 채워진 집
이 집에서의 삶은 그에게 맥시멀리스트적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집 크기에 맞춰 필요한 것만 남기고, 삶의 구조도 단순하게 정리해갔다. 공간의 중심을 잡아주는 요소는 MMK의 스틸 사이드보드다. 나무와 흰색 톤으로 정돈된 공간 속에서 스틸의 묵직한 질감은 절제된 긴장감을 부여한다. “전체적으로 목구조가 많다 보니 포인트로 스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길이 180cm의 매스감 있는 미니멀 디자인으로, 기둥 사이 한 칸間에 정확히 맞게 들어갑니다.”

저상형 침대는 슬로우베드 제품으로, 바스락거리는 면 소재 특유의 감촉 덕분에 덮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사계절 내내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기사 전문은 <행복이 가득한 집> 8월호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E-매거진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