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08월 삶 또한 한바탕 축제인 것을 (서명숙 이사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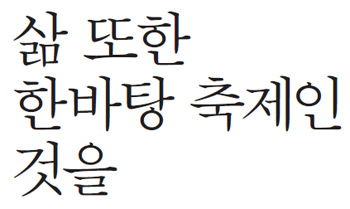 서명숙 씨의 네 번째 글 2007년 고향 제주로 30여 년 만에 귀향해 ‘사람이 사람답게 걸을 수 있는’ 제주 올레길을 내면서 내게는 또 다른 꿈이 싹트기 시작했다. 끊어진 길은 잇고, 사라진 길은 불러내고, 없는 길은 뚫어가면서 낸 이 길 위에서 ‘축제다운 축제’를 한판 벌여보는 것! 그런 꿈을 갖게 된 건 ‘한국형 축제’에 얽힌 쓰라린 기억 때문이다. 기자 시절 전국 이곳저곳의 축제 현장을 때로는 취재진으로, 때로는 관광객으로 기대감을 안고 찾아가보았더랬다. 떠날 때 품었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돌아오는 순간에는 ‘역시나’가 되기 일쑤였다. 축제 테마와 장소만 다를 뿐, 붕어빵을 찍어낸 듯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곤 했다. 내빈석 의자가 즐비하게 놓인 개막식장, 단체장과 기관장과 지역 유지들이 번갈아 늘어놓는 따분하기 이를 데 없는 기념사와 축사, 개막식장 주변에 설치된 똑같은 모양의 파고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엇비슷한 메뉴를 파는 포장마차들….
서명숙 씨의 네 번째 글 2007년 고향 제주로 30여 년 만에 귀향해 ‘사람이 사람답게 걸을 수 있는’ 제주 올레길을 내면서 내게는 또 다른 꿈이 싹트기 시작했다. 끊어진 길은 잇고, 사라진 길은 불러내고, 없는 길은 뚫어가면서 낸 이 길 위에서 ‘축제다운 축제’를 한판 벌여보는 것! 그런 꿈을 갖게 된 건 ‘한국형 축제’에 얽힌 쓰라린 기억 때문이다. 기자 시절 전국 이곳저곳의 축제 현장을 때로는 취재진으로, 때로는 관광객으로 기대감을 안고 찾아가보았더랬다. 떠날 때 품었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돌아오는 순간에는 ‘역시나’가 되기 일쑤였다. 축제 테마와 장소만 다를 뿐, 붕어빵을 찍어낸 듯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곤 했다. 내빈석 의자가 즐비하게 놓인 개막식장, 단체장과 기관장과 지역 유지들이 번갈아 늘어놓는 따분하기 이를 데 없는 기념사와 축사, 개막식장 주변에 설치된 똑같은 모양의 파고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엇비슷한 메뉴를 파는 포장마차들….
2009년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짐짓 외면한 채 중학생 아들과 함께 네덜란드 네이메헌 걷기 축제를 다녀온 것도 ‘질적으로 다른 축제’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인구 몇만 명의 조그마한 소도시에 나흘 동안 무려 5만~6만 명이 모여든다는 대표적인 걷기 축제였다. 군대 행군에서 비롯된 축제는 세월을 거듭해 내가 참가한 해에 이미 91주년을 넘기고 있었다.
군대 행군에서 비롯된 역사 탓일까. 이렇다 할 개막 행사도 없이 심심하게 시작한 출발, 소도시의 외곽 주변부를 방사선으로 도는 밋밋한 코스, 추운 지방이라서 식물도 다양하지 않아 새소리마저 거의 들리지 않는 무미건조한 풍경에 처음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하며 속으로 툴툴거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역시 명불허전 名不虛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리마다, 마을길마다 쏟아져 나온 주민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참가자들보다 더 흥겹게 축제를 즐겼다. 군 퇴역자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브라스 밴드, 오랫동안 공들여 연습한 흔적이 역력한 아줌마 합창단, 자기 집 앞에서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열연하는 어린이 바이올린 주자, 프로다운 실력을 과시하는 그룹 사운드…. 그야말로 남녀노소, 다양한 층위의 길거리 공연이 하루에 20~40km에 도전하는 참가자들의 고단함을 달래주기에 충분했다. 그뿐인가. 집에서 엄마가 구워준 쿠키를 접시에 들고 나와 참가자에게 수줍은 얼굴로 내미는 어린 소녀, 바람 부는 쌉쌀한 날씨에도 담요로 무릎을 덮고서 온종일 참가자들을 흐뭇한 얼굴로 지켜보는 할머니, ‘기회는 이때 다’라는 듯 맥주잔과 와인 잔을 들고 몸을 흔드는 젊은이도 축제를 즐기기는 매한가지였다. 바로 이런 것이 축제 아닌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참가자들의 열의가 어우러진 한 마당!
그토록 공들여 준비했건만, 야속도 하여라 지난해 우리는 오랫동안 꿈꿔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 위에서 처음 축제를 열었다. 이름 하여 ‘제주 올레 걷기 축제’! 봄부터 기획해 한여름 내내 올레길이 지나는 마을의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공연 준비를 도왔다. 관 주도 축제에 길들여진 마을분들도 처음에는 ‘별다른 지원도 없이 참가만 부탁하는’ 방식에 뜨악해했지만, 우리의 의도를 알고 난 뒤에는 열렬히 호응해주었다. 해녀와 아주망(아주머니를 뜻하는 제주어)과 초등학생들은 물질이 끝난 뒤, 저녁밥을 물린 뒤, 방과 후에 열심히 연습했다. 부녀회는 마을마다 겹치지 않는 향토 음식을 만들어 올레꾼들에게 팔기로 했다. 그러나 처음 열린 올레 축제는 ‘절반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아름다운 오름의 능선에서 초등학생들이 여선생님의 풍금에 맞춰 오카리나를 열심히 불었지만, 물새 떼가 날아드는 포구에서 유치원생들이 병아리처럼 입을 모아 동요를 불렀지만, 쌉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맨살을 드러낸 전통 해녀 복장을 한 제주 해녀 할망들이 태왁춤을 추었지만, 정작 발길을 멈춰 공연을 지켜보는 이는 드물었다. 아직도 놀멍, 쉬멍, 걸으멍, 먹으멍, 보멍 축제를 즐기는 일에 익숙지 않은 올레꾼들을 보면서 우리는 발만 동동 굴렀다. 미안해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건 토산리마을 한 아주망의 말이었다. “그 무슨 축제는 백 년 됐덴허멍예. 우리도 우리 자식대를 보고 참가해시난 걱정 맙서. 한술에 배불름니까? 길게 보게마씸.” 그래서 우리는 올해에도 꿋꿋하게 축제(11월 9일~12일)를 열 작정이다. 그것도 올레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6코스에서 9코스 구간에서. 제발 올해 축제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은 지난해보다 천천히 걸으시기를, 곳곳에서 펼쳐지는 작은 공연에 귀 기울이시기를, 발길을 멈추고 즐기시기를 빌어본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나중에, 목적한 바를 다 이루고 나면, 자신이 하고픈 것을 하겠다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사소한 것일지라도 충분히 즐겨야만 한다고 나는 믿는다. 인생도 알고 보면 한바탕 축제인 것을.
맞습니다. 인생은 한바탕 축제, 그것도 가끔은 숙제 같은 축제겠지요. 그러니 놀멍, 쉬멍, 걸으멍, 먹으멍, 보멍 ‘길게 보게마씸’의 마음으로 즐겨야 하는 축제겠지요. 올 11월, 저도 꼭 제주 올레에 가볼 생각입니다. 서명숙 이사장이 다녀온 네덜란드 네이메헌 걷기 축제처럼, 그가 만든 제주 올레 걷기 축제처럼 마을 사람들이 걷기 여행자들과 함께 벌이는 잔치에 끼어 한바탕 놀아보고 싶습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