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2월 이맘때는 늘 아름다웠다 (이영혜 발행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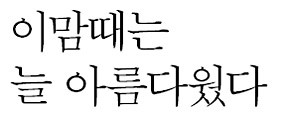 남서풍에 향기가 실려 오고, 귀뚜라미 울음이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밤하늘의 별자리가 바뀌는 이맘때는 늘 아름다웠다. 어떤 맑은 날, 편지함 옆의 흰 자작나무 위로 흰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광경은 숨 막힐 만치 아름답다. - <행복한 사람, 타샤 튜더> 중
남서풍에 향기가 실려 오고, 귀뚜라미 울음이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밤하늘의 별자리가 바뀌는 이맘때는 늘 아름다웠다. 어떤 맑은 날, 편지함 옆의 흰 자작나무 위로 흰 기러기 떼가 날아가는 광경은 숨 막힐 만치 아름답다. - <행복한 사람, 타샤 튜더> 중
이 글귀를 날려 보낸 사람한테 일단 잠깐 감사,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나면 보아야지 하고 옆으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 시를 보내기 적절했던 계절을 넘길 무렵 책과 종이 더미 속에서 삐죽이 나타나, 버리지 않고 두었다는 것에 스스로를 조금 기특하다 여기며 드디어 문장을 찬찬히 그리고 느리게 따라가 봅니다.
‘지금 부는 바람이 남서풍인지를 어떻게 알지? 작가들은 바람의 향방을 문장 속에 곧잘 적어놓는데….’ 어느 계절이라도 한 번도 바람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는 저를 기본으로 생각해본다면 시인들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귀뚜라미 울음이 느려지기 시작한다? 귀뚜라미 울음이 느려지는 것을 보니 가을이 지나가고 있다는 뜻인가? 그렇겠지….’ 생각해보니 귀뚜라미 소리를 들은 적이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울음소리의 템포를 감지해볼 턱은 당연 없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가 바뀐다더니 과연 그렇군. 엊그제 초승달은 정말 예뻤어….’ 별자리를 그어본 지가 오래된 저는 동문서답하듯 별 이야기하는데 달 생각이 언뜻 스쳤습니다.
‘굵지 않은 하얀 몸을 가진 것이 자작나무잖아. 이 나무는 조금 추운 지방에서 자란다지? 그 옆에 편지함. 예쁘겠다….’ 가로로 길게 목을 내놓은 편지통과 하얀 자작나무는 잘 어울리는 구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파트 입구의 못생긴 편지함들이 스치기에 기겁을 하듯 지우면서 시를 망치고 있는 저를 나무랐습니다.
‘기러기 떼가 하얗다니, 까맣지 않고? 암튼 그 광경이 집에서 그냥 보이나 보지? 집은 정말 넓은 마당을 가진 자연 속에 있어야 해.
그저 주변 스케치를 글로 적어도 저절로 시가 되는 풍경이 있어야 이런 시가 나오지, 굳이 감성이 풍부하다고 해서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우하하. 정말 혼자 웃었습니다. 시를 따라가면서 감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마다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부럽다 못해 은근히 부아를 내고 있다니요.온통 어려운 시절이 왔다고 야단하니 온전히 감상 못하는 마음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내년이 정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낙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글쎄, 모두가 겪어야 한다면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가야 하는 군대라면 기피하지 말고 오히려 훈련을 트레이너 삼아 몸을 만들든가, 인생 전체를 통해 진한 추억거리로 만들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지혜로울 터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잘 보낸 젊은이에게 ‘이제 사람이 되었더라’는 소리를 하게 되듯이 말입니다.
자연, 문학, 예술, 철학… 그것이 돈 되느냐고 제쳐버린 일들이 얼마나 모자란 똑똑함이었던지요. 그러니 경제가 어려워지니 마음까지 곧 가난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할 그것들이 버려서는 안 되는, 어쩌면 가장 배고플 때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경제지표 따라 흔들리지 않고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어려운 시절이라면 이럴 때 책도 더 읽고, 생각 주머니도 키우고, 소식으로 몸도 만들어야겠고…. 이럴 때는 청소도 더 잘해서 가난도 빛이 날 정도로 깔끔하게 정돈해두어야지 마음먹고 나니 이제는 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차분한 자신감이 밀려옵니다.
튜더 할머니가 우리를 낯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돈과 바꾸지 않은 평범한 것들이 숨 막히게 아름답다고, 우리가 놓친 것들을 일깨워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 년을 보내는 마지막 달이 하마터면 희망도 결심도 없이 무겁고도 우울할 뻔한 것을 짧은 시 한 수로 되짚어보다니 역시 인문학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인가 봅니다. 여러분, 힘내지 말고 힘을 비축하십시다. 그래서 너무 풍요로워서 안 보였고 안 들렸던 것들을 이제 찾을 시간입니다.
추신 : 있죠, 자신이 써놓고도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읽기 아깝다고 생각되는 시를 지으셨다면 주저 말고 저희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함께 읽어요.
로그인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