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1월 마음이 두가지, 소풍전략 (이영혜 발행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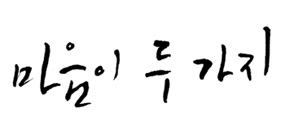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기에 들어오지 말라니까….”
친구는 머쓱하게 제가 앉을 자리를 만들면서 도리어 왜 왔느냐고 핀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짐을 못 풀었어… 아마 마음의 짐이 안 풀렸는지도 모르지….”
씁쓸하게 고개를 돌리는 그녀는 남편과 거의 헤어질 것 같은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로 나오기 전의 그녀와 집은 남다른 눈썰미, 손맛, 거기에 깔끔함까지 갖추어 친구들이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고 자문까지 하던 터였습니다. 저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아직 그녀는 헤어질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큰소리를 치고 나왔고 굳은 결심을 했다지만, 이렇게 집 안을 그냥 엉망으로 둘 그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는 갈등 중, 임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한 곳에 정착▪정주定住하고부터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곧 방을 비워야 할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제 친구처럼 짐도 제대로 풀지 않은 채 살 것입니다. 유목민처럼 언제든 떠날 채비를 해두는 상황에서는 그 언저리에 무엇을 자라게 할 수도 없는 거지요. 부딪혀도 깨지지 않을 그릇 몇 개, 쉽게 걷을 수 있는 천막…. 한마디로 부서질까 봐 유리 그릇은 가져볼 수도 없으니 문화의 뿌리가 얕고 세련되지 못하며 다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떤 건축가는 현재 우리들이 주거지를 그저 평당 가격으로 만들어낸 재화의 용도로만 살고 있다고 끌탕을 칩니다. 그러한 풍토에서는 토착의 힘이 자랄 수가 없고, 전통을 되새김질할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밑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 또한 부족한 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평균, 일생 서너 번은 이사를 다닌다니, 그런 만큼 우리 사회는 늘 짐을 덜 푼 상태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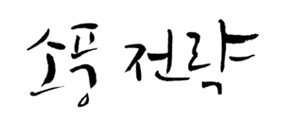
저는 아주 화가 나거나 욕심이 과해질 때, 아니면 그 반대로 제가 아주 게으르거나 한심하게 생각될 때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떠올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갈걸 뭐, 이 지구에 소풍을 온 거라면서? 지나가는 과객過客에 불과한데…’라고 천천히 되뇌어보는 것입니다. 동양의 철학적 의미를 가진 ‘소풍’ 생각은 제게 아주 유효합니다. 어차피 인생이 이 지구에 잠깐 소풍을 온 것이라면, 들판 어디에 자리를 깔더라도 돌아가지 전까지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이고, 소풍 온 이답게 즐기면 되는 시간. 사는 동안 어딘가를 잠깐 빌린 것이라면 낡았더라도, 작더라도, 사글세를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설령 타지 혹은 외국에 나가 살게 되더라도 주어진 공간을 가득 향유하리라…. 이렇게 스스로를 부추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돌아갈 때는 싸갔던 음식 다 먹고, 가벼워진 가방과 한껏 웃고 즐긴 마음 추스리며 소풍 끝내는 시간처럼, 이 길을 그저 바라다보고 지나갈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상스레 용서, 이해, 겸허 같은 단어와 가까워지고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의 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짐을 풀어놓을 수 있는 삶의 기술은 같은 논리이며, 상황에 따라 잘 갖다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자유자재로, 적시적소에, 역지사지로 소용되게 하는 ‘소풍 전략’, 간간이 활용할만 하지 않으십니까?
ps) 지난호부터 <행복이 가득한 집> 글씨체를 바꾸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못 쓴 글씨냐고 타박하던 분들도 인목대비께서 쓰신 글씨를 조합했다고 답하면 조금 우물쭈물하십니다만, 이번 달 한참 들여다보아주세요. 정이 조금 들지 않는지요.
로그인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