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고목나무에 꽃핀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7백50년 된 나무에 해마다 감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지 않고선 믿기 어려울 터.
(오른쪽) 단감은 짚바구니에 툭툭 던져놓은 모습만으로도 한 폭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재주를 지녔다.
하늘 아래 첫 감나무에 늙은 아들이 올랐다. 여든아홉 어머니는 감 따는 아들 보려 하늘로 눈을 준다. 하늘은 쪽빛이요 먹감은 주홍빛. 그림이 따로 없다.
늘어진 가지마다 많이도 달렸다. ‘감 따는 사람은 죄다 보험 들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지 싶다. 약하고 잘 썩어서 툭하면 부러지는 제 처지는 생각 않고 주렁주렁 열매를 매단 품새가 이 세상 모든 어미들의 젖가슴을 보는 것 같아 푸근하고 정겹다. 경상북도 상주에는 ‘하늘 아래 첫 감나무’라 불리는 감나무가 한 그루 있다. 7백50년 수령수다. 천세를 누리는 것만으로도 장한데 아직도 둥근 둥시감을 그리도 많이 내는 나무의 주인을 만났다. 외남면 소은리 ‘쪼매난 농원’의 김영주 씨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유독 수령이 오래된 감나무가 많아 보호수로 지정된 까닭에 상주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다. 예나 지금이나 ‘동감나무’는 살림 밑천. 나무는 굵은 밑동이 두 갈래로 갈라져 속이 훤히 빈 채 두 그루 나무처럼 서 있다. 속이 비어서 나이테도 없다. 그의 어머니가 열여덟에 시집와 살기 시작했을 때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다고 한다. 군데군데 땜질도 했고 때때로 링거액도 맞는다지만 그래도 아직 정정한게 여전히 감을 늘어지게 매달고 있다. 경북대 임학과 교수들이 유전자 감식을 통해 한나무라는 것을 밝혀내고 나이까지 어림해냈다.

쪼매난 농원 주인인 김영주 씨가 사는 집. 하늘 아래 첫 감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고엽나무에 둥시나무를 접붙인 나무지요. 그 옛날에도 기술이 좋았나 봐요. 생긴 그대로 두지 않고 접붙여 가면서까지 실한 열매를 얻었던 걸 보면. 상주에 감나무가 워낙 많다 보니 임금께 진상도 하고 감 농사도 지었겠지요. 토질이 황토라 감이 유별나게 잘되거든요, 이 동네가.” 접붙이기가 성했다는 건, 적극적으로 감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일까, <예종실록>에는 예종이 즉위한 해인 1468년 11월 13일에 상주에서 곶감을 진상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전국 곶감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는 상주 곶감의 명성은 이미 그때도 자자했던 모양이다. 5백 년도 더 된 일이니 어쩌면 김영주 씨가 오른 오늘 이 나무가 그때, 그 진상품을 내놓던 귀한 나무였을 수도 있을 터이다. “옛날부터 큰 나무는 동감나무라고 불렀어요. 나무 한 그루에서 감 한 동을 딸 수 있다고 해서. 한 동이 1백 접이고, 한 접이 1백 개니까 계산해보면 나무 한 그루에서 감 1만 개를 땄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하죠. 동감나무 하나면 자식 대학 공부도 걱정 없달 정도였으니까요.”
대부분의 과수는 수령이 오래되면 소출이 시원찮다. 하지만 감나무만은 다르다. 50년 이상이 되어야만 때깔 좋은 감이 많이 열리고 감 맛이 쫀득쫀득 별나게 좋다. 신기한 얘기. ‘하늘 아래 첫 감나무’도 여전히 달고 차진 감을 낸다. 늙은 나무에서 열리는 감은 표면에 거뭇거뭇한 것이 생기는 게 특징인데 열매에도 검버섯이 피나 싶다. 그래도 그런 먹감이 맛이 좋단다. 워낙 귀하고 상징성이 있는 감이다 보니 해마다 서울의 유명 백화점 바이어가 날을 잡아 직접 내려오는데 눈앞에서 수확을 하고 따로 말려 곶감을 만들어 납품한단다. 현대판 진상품인 셈이다.

(왼쪽) 껍질을 깎아 손질한 감은 감꼭지에 실을 매어 이렇게 주렁주렁 늘어뜨려 말린다. 20일이 지나면 겉은 쫀득쫀득하고 안은 보들보들한 반건시가 만들어진다.상주에서는 어딜 가나 이렇게 집집마다 감을 내다 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마당이나 장독대는 기본이고 처마 밑에도 주렁주렁 매단 모습이 정겹다. 감꼭지를 실에 매다는 일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내야 한다.
(오른쪽)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두 갈래로 갈라진 밑동. 보기에는 서로 다른 나무 같지만 유전자 검식 결과 한나무로 인정받았다. 때때로 링거 신세도 지지만 아직까지도 한 해에 5천 개에 이르는 감을 수확할 수 있는 기특한 나무다.
할머니의 손자 사랑, 감또개 매년 10월 중순께가 되면 상주의 둥시감 수확이 시작된다. 온 천지가 다 주홍빛인데 가을 단풍보다 더 곱다. 떫은맛이 남아 있는 상태의 아직 다 익지 않은 감은 주로 남자들이 딴다. 감을 따 오면 여자들은 마당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감을 깎는다. 20일 이상 밤낮으로 이어지는 작업이다. 예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깎아야 했지만 다행히 지금은 모터가 달린 반자동 박피기를 사용한다. 상주는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이 가장 부산하면서도 흥겹다. 밤잠을 줄여가며 일해도 사방에는 아직 못 딴 감, 아직 못 깐 감이 널려 있다. 감 서리는 서리 축에도 못 끼는 게 상주 인심이란다. 그래서일까. 길가에 널린 게 감인데 하도 탐이 나 차를 세우고 몇 개 따는 즐거움(?)을 만끽하는데 뭐라 제재하는 사람이 없다. 운 좋으면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로 말랑말랑하게 익은 자연 홍시를 따 그 자리에서 맛볼 수도 있으니 늦가을에는 여행삼아 상주를 찾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짜 홍시 한두 개 먹는 재미로라도. 껍질을 깎아 손질한 감은 집집마다 적게는 수십 접에서 많게는 수십 동까지 내다 말린다.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감꼭지에 실을 매어 주렁주렁 늘어뜨리고 자연 건조를 시키는데, 빛 고운 어떤 발도 곶감 덕장에 매달린 감만큼 현란하지는 않지 싶다. 아직도 사람 손으로 일일이 매달아야 하는데 집집마다 매달린 감을 보면 저게 다 사람 손을 탄 것이지 싶어 값이 비싸다는 엄살이 쑥 들어가고 만다. 도시에서야 말린 곶감 하나만 보게 되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수고와 정성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왼쪽) 김영주 씨의 어머니 최옥용 할머니도 며느리에게만 일을 맡겨놓지 않고 이렇게 매일 감 깎는 일을 해낸다. 때때로 서울 딸네도 보내고 방학 맞아 내려오는 손자들 먹일 감또개도 만드느라 여전히 바쁘게 손을 놀리는 것이다.
(오른쪽) 하늘이 높아지고 저수지의 연잎이 누렇게 마르기 시작하는 이때가 감을 따는 적기다.
20일이 지나면 겉은 쫀득쫀득하고 안은 보들보들한 반건시가 만들어지고 50일쯤 말리면 하얗게 분이 오른 곶감이 완성된다. 요즘 사람들 입맛에는 살짝 말려 아이스크림이나 젤리처럼 즐기는 게 인기. 상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곶감의 양은 어림잡아도 5천 톤이 넘는다. 수확철에 감 공판장에서 거래되는 양만도 하루 2만 5천 박스. 220g짜리 감을 말려 만든 최상품 곶감은 무게가 50g 정도 나가는데, 말리는 동안 수분이 70%는 날아가기 때문이다. 덜 익어 떫은맛이 나는 감을 말리는 동안 타닌 성분이 불용성으로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단맛이 우러나는데 이렇게 만든 곶감은 3 8 냉동9 보관을 해도 속까지는 얼지 않고 10분만 상온에 두고 해동시키면 알맞게 녹아 딱 먹기 좋은 상태가 된다. 속이 꺼멓게 변한 것은 제대로 건조시키지 못한 것인데 모양도 좋지 않지만 맛과 향도 확실히 덜하다.
정년 퇴임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한 김영주 씨는 ‘쪼매난 농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규모 농사를 짓지는 않는다. 그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 있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을 건사하는 정도에서 소일거리 삼아 감 농사를 짓는다. 그의 농원에는 3백 년 이상 된 고목 17그루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나무한 그루당 적어도 50접은 되는 감을 수확한단다. 청도에서 생산하는 반시감이 납작한 모습인 데 반해 상주 감은 봉긋하게 엎어놓은 종 모양을 하고 있는 둥시감이 대부분이다. 씨가 없어 먹기 편한 반시감은 주로 홍시로 먹지만 씨가 서너 개 들어 있는 둥시감은 거의 대부분 곶감을 만든다.
“그냥 먹기엔 좋을지 몰라도 제사상에는 반시감 놓으면 큰일나지요. 씨 없는 놈이니까요.”
한국인의 정서에 ‘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터. 후손이 조상을 모시는 제사에 ‘씨 없는 감이 웬말이냐’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왼쪽) * 쪼갠다는 뜻의 사투리에서 따온 말인 ‘감또개’는 겨울 한 철 상주 사람들의 간식거리가 되는 할머니표 곶감이다.
(오른쪽) 거뭇거뭇한 반점이 생긴 먹감은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서 열리는데 때깔은 좋지 않아도 달디단 맛만은 그만이다
김영주 씨의 어머니 최옥용 할머니가 마당 한쪽에 가더니 자리를 잡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썰고 있기에 가까이 가서 보니 역시나 감이다. 그 세월의 관록 또한 만만치 않을 듯싶은 도마에 날이 무딘 무쇠칼 하나. 감또개를 만들 요량인 듯했다. 쪼갠다는 뜻의 사투리에서 따온 말인 ‘감또개’는 겨울 한 철 상주 사람들의 간식거리. 볼품없이 생겼거나 나무에서 저절로 떨어져 깨진 감을 가지고 두께 1cm 정도로 툭툭 썰어내서는 햇볕에 널어 말린 게 바로 감또개인데 할머니표 홈메이드 곶감인 셈이다. 열흘만 말리면 꼬들꼬들하니 달콤한 감또개가 만들어진다.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말려서는 자루에 담아 서울 사는 딸네에도 보내고 방학 때 찾아오는 손자들 군것질거리로도 내놓는단다. 곶감은 그늘에서 말려야 모양도 예쁘고 때깔도 나지만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감또개는 햇볕에 널어 말리는 것이 다르다. 빨리 마르기도 하지만 모양을 살필 필요 없이 꼬들꼬들한 맛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이 흔한 집이어서일까? 집 앞에 멍석을 깔고 깎아낸 감 껍질을 말리기에 어디에 쓸지 물었더니 집에서 기르는 개를 먹이는 거란다. 개가 하도 좋아해서 일 년 내내 주는데 밥보다 더 좋아한다고.
예전부터 감은 우리 정서와 가까운 과실이었다. 일 년 내내 두고 먹는 과일로는 유일하니 그럴 만도 했을 것이다. 단감은 깎아 먹고 더러는 겨우내 짚을 깐 독에 넣어두고 홍시로 만들어 할머니와 손자가 긴긴 겨울밤 간식으로 즐겨 먹었다. 잘 말린 곶감은 조심스럽게 건사해두었다가 일 년 내내 간식으로도 쓰고 손님상이나 제사상에 올리기도 했다. 우는 아이도 방긋 웃게 만들 수 있었다는 어미들의 묘약 또한 곶감 한 알이었다. 돌이 어미 연지는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자꾸 울면 호랑이에게 던져준다’고 으름장을 놓았더랬다. 문 밖의 호랑이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지만 “곶감이다. 뚝!” 그 한마디를 듣고서야 돌이는 울음을 그쳤다. 놀란 호랑이가 곶감이라는 엄청 무서운 짐승에 지레 겁을 먹고 산속으로 도망치던 밤, 엄마 품에서 곶감을 오물거리던 돌이는 포근하고 행복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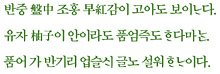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워 ‘조홍시가 早紅枾歌’를 읊었던 조선시대 박인로. 쟁반 위에 놓여 있던 홍시 알에서 어쩌면 그도 어머니 품에서 곶감 한 알에 울음을 그쳤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곶감은 천륜의 사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