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붕과 뒷산 사이에 데크를 만들어 후원을 꾸몄다.
편집부에 두툼한 파일 한 권이 우편으로 날아들었다. 그 안에는 1992년 1월호 <행복>에 실린 기사도 한 편 담겨 있었다. 이 소포의 주인공은 화가 한영섭 씨다. “지난해 여름부터 정년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교단을 떠나니 오직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20년 전 마련한 작업실을 재정비하면서 옛 생각이 나더군요.” 그가 1백여 장의 사진을 보내온 작업실 겸 가정집에는 언뜻 보아도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다. 20년 만에 하는 개조 공사는 처음 집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과정이 그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1992년 1월호 <행복>에 ‘개성이 빛나는 집’으로 소개했던 집이 20년이 흐른 지금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소식을 알려 온 것이다.
뒷산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던 날,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에 자리한 화가 한영섭 씨의 집을 찾았다. 지난 1년간 뚝딱뚝딱 집을 고치느라 한 동안 작품에서 손에서 놓았다. 어찌나 손재주가 좋고 부지런한지 일주일 만에 후원을 꾸몄다며 진달래 만발한 뒷동산으로 안내했다. 작업실 2층에서 밖으로 나서니 바로 뒷산 중턱이다. 그는 지난 주 내내 톱질과 못질을 번갈아가며 새로운 데크를 만들었다고 한다. 구름다리처럼 산중턱과 작업실 지붕을 연결하는 너른 데크를 혼자 힘으로 만들었다니 대단한 솜씨다. 이 후원이 안고 있는 또 다른 재미는 새로 만든 데크를 거쳐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지붕을 밟고 저 멀리 도시 풍경과 중첩되는 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맨 땅을 밟고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1 한영섭 씨가 한지에 깻잎 줄기를 탁본하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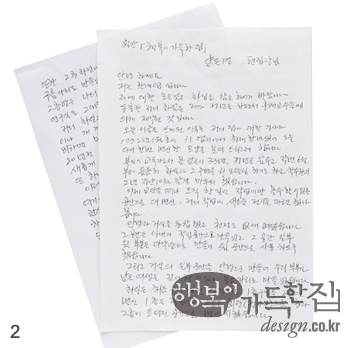 집 안으로 들어서니 2층 높이의 천장이 뻥 뚫린 거실이 나타난다. 원래 방이 있던 자리를 헐어내고 천장을 거두어낸 것이란다. 이곳은 이제 아내의 화실이 되었다. “집사람도 그림을 그려요. 홍대 미대 동기였는데 아내는 여고에서 교편을 잡았죠. 그동안 작업실이 따로 없었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출가했으니 방을 터서 작업실을 만들어주었죠.” 아내의 작업실 겸 전시 공간인 거실을 시작으로 안방, 부엌, 서재, 자신의 작업실을 함께 돌아보며 그는 20년 전 구조와 지금의 변화를 세세히 설명해주었다. 창문은 낡고 오래되어 보였고 손수 칠한 페인트 마감은 매끄럽지 못했으며 시선을 사로잡는 멋스러운 가구 하나 없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림 같은 장면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집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눈으로 바라보면 투박하고 조금한 어눌한 집이지만 마음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집이다. 필요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사는 이가 직접 손질하며 관리해온 집. 리모델링이라는 명목하에 지난 세월 가족의 역사를 흔적도 없이 들어내는 도시의 집들과 달리 이 집은 획기적인 구조 변경을 단행했음에도 네 가족이 함께 살아 온 2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것은 사람을 질리게 해요. 나는 그런 것도 일종의 공해라고 봐요. 사람을 지치게 하거든요.” 예술이나 집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는 매끈하고 세련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투박하고 불완전한 것이 품는 온화하고 넉넉한 정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2층 높이의 천장이 뻥 뚫린 거실이 나타난다. 원래 방이 있던 자리를 헐어내고 천장을 거두어낸 것이란다. 이곳은 이제 아내의 화실이 되었다. “집사람도 그림을 그려요. 홍대 미대 동기였는데 아내는 여고에서 교편을 잡았죠. 그동안 작업실이 따로 없었어요. 이제 아이들도 다 출가했으니 방을 터서 작업실을 만들어주었죠.” 아내의 작업실 겸 전시 공간인 거실을 시작으로 안방, 부엌, 서재, 자신의 작업실을 함께 돌아보며 그는 20년 전 구조와 지금의 변화를 세세히 설명해주었다. 창문은 낡고 오래되어 보였고 손수 칠한 페인트 마감은 매끄럽지 못했으며 시선을 사로잡는 멋스러운 가구 하나 없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림 같은 장면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집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눈으로 바라보면 투박하고 조금한 어눌한 집이지만 마음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집이다. 필요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사는 이가 직접 손질하며 관리해온 집. 리모델링이라는 명목하에 지난 세월 가족의 역사를 흔적도 없이 들어내는 도시의 집들과 달리 이 집은 획기적인 구조 변경을 단행했음에도 네 가족이 함께 살아 온 2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완벽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것은 사람을 질리게 해요. 나는 그런 것도 일종의 공해라고 봐요. 사람을 지치게 하거든요.” 예술이나 집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는 매끈하고 세련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투박하고 불완전한 것이 품는 온화하고 넉넉한 정서에 대해 이야기했다. 2 <행복>에 보내온 편지

1 리모델링을 통해 아내의 작업실이 된 거실에는 아내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2 돌과 옹기로 장식한 창가의 여유로운 풍경.
 “아이들이 중3, 고3일 때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큰 작업실을 가질 수 없기도 했고, 내 작품의 근간이 자연이니까 자연에 가까이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족들에게 너무 큰 희생을 치르게 한 것 같단다. 1층은 작업 공간으로, 2층은 회랑을 만들어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의 작업실로 향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작업실 바닥에 겹겹이 쌓여 있는 먹물 자국이다. 세월과 연륜을 전해주는 작업실 바닥이 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깻잎 줄기로 작업한다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 그에게 작업에 대해 물었다. “1970년대 말 즈음이었을 거예요. 평창에 갔다가 우연히 돌멩이 하나를 봤어요.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돌멩이를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집으로 들고 와서 고민을 했지요. 이걸 어떻게 작품에 접목시킬 것인가…. 한지로 싸서 돌 표면을 탁본하기로 맘먹었지요.” 둥그런 돌멩이를 감싸서 탁본할 수 있는 종이는 세상에 한지 밖에 없다며 작업 과정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는 그렇게 다양한 자연물을 한지에 탁본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지속해왔다. “나는 추상 작업을 하지만 그 대상물은 모두 자연이에요. 숲을 바라보면 자연은 구상의 세계지만 그 안을 부분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상의 세계가 존재하지요. 나무 잎사귀나 식물 줄기를 들여다 보아도 그렇고 돌이나 흙을 보아도 그렇고….” 이렇듯 자연에서 작품의 근간을 찾는 그에게 전원 생활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아이들이 중3, 고3일 때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큰 작업실을 가질 수 없기도 했고, 내 작품의 근간이 자연이니까 자연에 가까이 머물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족들에게 너무 큰 희생을 치르게 한 것 같단다. 1층은 작업 공간으로, 2층은 회랑을 만들어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의 작업실로 향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작업실 바닥에 겹겹이 쌓여 있는 먹물 자국이다. 세월과 연륜을 전해주는 작업실 바닥이 작품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깻잎 줄기로 작업한다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아 그에게 작업에 대해 물었다. “1970년대 말 즈음이었을 거예요. 평창에 갔다가 우연히 돌멩이 하나를 봤어요. 그게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돌멩이를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집으로 들고 와서 고민을 했지요. 이걸 어떻게 작품에 접목시킬 것인가…. 한지로 싸서 돌 표면을 탁본하기로 맘먹었지요.” 둥그런 돌멩이를 감싸서 탁본할 수 있는 종이는 세상에 한지 밖에 없다며 작업 과정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는 그렇게 다양한 자연물을 한지에 탁본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지속해왔다. “나는 추상 작업을 하지만 그 대상물은 모두 자연이에요. 숲을 바라보면 자연은 구상의 세계지만 그 안을 부분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상의 세계가 존재하지요. 나무 잎사귀나 식물 줄기를 들여다 보아도 그렇고 돌이나 흙을 보아도 그렇고….” 이렇듯 자연에서 작품의 근간을 찾는 그에게 전원 생활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뒷산을 후원 삼아 사는 일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것이란다. 개나리와 진달래로 시작하는 봄꽃에서부터 사시사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들꽃 무더기까지. “산과 들에서 꽃을 볼 수 없는 겨울이 되면 저이는 장화를 신고 눈 덥인 산으로 가서 개나리나 진달래 가지를 꺾어 와요. 화병을 양지 바른 곳에 두고 물에 꽂아두면 1~2주일 후에 꽃을 볼 수 있어요. 창 밖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눈 덮여 있는데 집 안에 봄꽃이 피어 있으면 정말 볼 만해요.” 창 밖으로 눈발이 날리는데 거실에 놓인 커다란 항아리에 개나리가 한 가득 피어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아내가 말한다. “이이는 앞산이고 뒷산이고 어디 가면 무슨 나무가 있다, 이건 캐와도 된다 안 된다 다 알아요. 이러니 서울에선 절대 못 살죠.”
3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었던 백구 흰둥이.

4 전시장으로 꾸며 놓은 한영섭 씨의 작업실 2층 풍경.
5 후원과 다름없는 뒷산은 아담한 숲을 가지고 있다. 이들 부부는 이 숲길을 가로질러 이웃을 만나러 가기도 산책을 즐기기도 한다.
주말마다 들르는 별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 출근해야 할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20년 동안 아이들 키우며 전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터. 그는 교편을 잡았던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로 출근하기 위해 처음 10년 동안은 차를 네 번이나 갈아타야 했다고 한다. 그렇게 고된 출퇴근길을 겪으면서도 지난 23년간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생활의 편리함을 내준 것이다. 더 이상 고단한 출퇴근길은 없다. 그는 자연을 벗하며 작품 활동에 푹 빠져 볼 요량이다. 그가 직접 설계하고 손수 쌓아 올린 이 집은 어느덧 스무 살 성년이 되었다. 이제 인생 2막이라는 한영섭 씨에게 이 집은 무대가 되어줄 것이다. 언제나 그를 응원하는 가족이 관객이 되고 아름다운 자연이 배경이 되는 풍요로운 무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