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07월 마음 열기 연습 (양창순 박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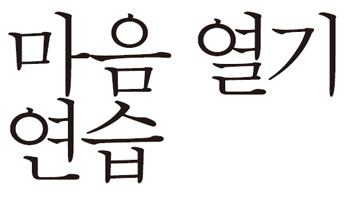 양창순 박사의 세 번째 글
양창순 박사의 세 번째 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두 번은 산책을 나가야 한다. 어느 때는 새벽이나 늦은 밤에 집을 나서야 할 때도 있다. 산책을 거르면 녀석의 만만치 않은 반발에 부딪혀야 하는 탓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덕분에 얻는 것이 아주 많다는 점이다.
우선 몸이 건강해진다. 늘 시간에 쫓기는 처지에 하루 두 번의 산책이라니, 전 같으면 그런 호사는 꿈도 꾸기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한두 시간 강아지와 공원을 돌다 보니 저절로 살도 빠지고 몸도 가뿐해지는 느낌이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때때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처음 새벽 산책을 나갔을 때 일이다. 공원에 그토록 많은 새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새가 한꺼번에 지저귀고 있었다. 강아지조차 고개를 갸웃거리며 새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더 흥미로운 사실도 알았다. 좀 더 이른 새벽에는 아주 조그만 새들이 땅에 내려앉아 먹이를 쪼아 먹곤 했다. 아마도 공원에 무서워할 만한 존재가 그리 없으니 안심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로부터 한 시간쯤 늦은 시간에 가보면 사람이 많아진 대신 작은 새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다. 훨씬 몸집이 큰 새들이 공원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녀석들은 사람들이 무섭지 않은 게 분명하다. 실제로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피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아무튼 그렇게 새들도 나름대로 생존 수칙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다. 새들이 대견하고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자 예쁘고 사랑스럽게까지 여겨졌다. 역시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동안 새라고 하면 그저 히치콕의 작품 속 새나 도시의 비둘기를 떠올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당연히 예쁘거나 사랑스러운 것과는 연이 없을 수밖에. 그런데 공원의 새들에게 마음을 열자 녀석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가왔다. 지금은 새들의 지저귐에도 오래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 소리의 다양함도 나를 매혹시킨다. 녀석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낼 때는 지저귐이 다 똑같은 것 같다. 하지만 가만히 귀 기울이면 각기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원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많아진 것 역시 새로운 경험이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강아지들과 그 주인들과는 어느덧 소소하게 대화를 트고 지낼 만큼 가까워졌다. 딸아이가 강아지를 보고 “네가 나보다 동네에 친한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 하고 감탄할 정도다.
이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새삼 마음을 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곤 한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생각과 달라서 싫고, 저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니라서 싫다며 골라내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사람들은 훨씬 더 다양한 층위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런데 “이건 틀렸어.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그러니 알 필요가 없어” 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각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우린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마음이나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마음이 강한 사람은 실수나 실패 앞에서도 초연하고 인간관계에서도 당당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일에서 실수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자신의 약한 마음을 탓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화급히 닫아걸곤 한다. 하지만 우린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실수나 실패를 용감하게 드러낼 때 사람들은 서로 더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먼저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헨리 제임스에게는 조카가 여럿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삶의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하다가 삼촌에게 편지를 보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에 관해 유명한 작가인 삼촌에게 답을 구한 것이다. 그러자 헨리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인생에는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친절할 것, 둘째 친절할 것, 셋째 친절할 것.” 헨리 제임스는 세상의 모든 다양성 앞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는 뜻으로 그토록 친절을 강조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따뜻한 우정과 사랑 역시 내 편이 되어줄 것이므로.
양창순 박사의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가 베스트셀러인데요. 이 책 앞에서 지갑을 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건강한 까칠함’을 갈망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보내온 이 글에선 ‘까칠함’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찬찬히 읽으니 그가 말하는 ‘건강한 까칠함’은 곧 마음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보이며 살아가기였군요.그게 바로 제대로 된 마음 열기이겠지요.
양창순 박사는 연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주역과 정신의학을 접목한 논문으로 성균관대학원에서 두 번째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양창순신경정신과, 대인관계클리닉 원장으로 있고, 연세대 정신과 외래 교수입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