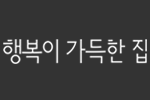북촌 한옥마을에서도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메인 거리인 가회동 31번지. 한옥 호텔 브랜드 노스텔지어는 2022년 블루재와 히든재, 힐로재를 시작으로 31번지 일대에 각각의 정체성이 살아 있는 하이엔드 한옥 호텔을 꾸준히 오픈하고 있다. 불과 3년 만에 한옥 다섯 채를 완성하며 이제는 노스텔지어의 흔적을 발견하지 않고 지나치기가 어려울 정도. 그리고 지난 4월 여섯 번째 한옥 더블재가 문을 열었다. 지금까지 선보인 한옥이 화려하고 럭셔리한 이미지라면, 더블재는 차분하고 따스한 모습으로 사뭇 다른 분위기다. 투숙객을 환대하는 따뜻한 인상은 오르막길을 오르면 가장 먼저 만나는, 둥글게 말아 들어가는 벽돌 벽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정민 작가가 염장 보유자 조대용 선생의 작품을 촬영한 사진 작품 ‘발’과 황정화 작가의 볏짚 민예품.
“더블재는 북촌 8경 중 5경이 있는 메인 길목의 모퉁이에 위치해요. 감나무집이라 불릴 정도로 상징적인 곳이었죠. 노스텔지어는 모두 가회동에서 좋은 장소에 자리하지만, 더블재는 그중에서도 중요한 스폿이라 할 수 있어요.”
온지음 집공방 박채원 소장이 덧붙인 설명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 흔치 않은 귀한 입지라고. 31번지 일대의 한옥이 남향이지만 진입은 대부분 동쪽 또는 서쪽으로 하는 데 반해 더블재는 남쪽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 대문을 열면 작은 골목과 한옥이 보이는 풍경도 무척 아름답다. 보석 같은 존재를 알아본 노스텔지어 박현구 대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한옥에 접근했다. “이전까지는 노스텔지어가 운영을 도맡았다면, 이곳은 자신만의 색이 뚜렷한 브랜드와 협업해 호텔 외에 브랜드 철학도 함께 담긴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면 좋겠다 싶었어요. 윤현상재는 타일 유통 회사로 물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전시를 비롯한 문화, 예술 프로젝트에서도 탁월한 기획력과 문화적 감도를 보여주는 곳이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었죠.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아 협업을 제안했습니다.”

복도에서 바라다보이는 거실과 마당. ㄱ자형 한옥과 일자형 한옥이 붙은 덕분에 복도라는 독특한 공간이 생겼다.
최주연 대표는 박현구 대표에게 제안을 받았을 때 ‘왜 우리에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올랐다고.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고민하다 보니 어쩌면 저희의 생각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동안 오래 연구해온 한국의 미학을 한 장소에 담아보고 싶기도 했고요. 하이엔드만 살아남는 리빙 시장에서 한국의 고유한 주거 양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펼쳐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방에서 보이는 정원. 멀리 남산타워까지 내다보이는 전망, 더블재의 상징과도 같은 감나무와 벽돌 벽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정원은 정원사 이대길이 작업했다.
그렇게 노스텔지어와 윤현상재의 협업이 이뤄졌고, 최주연 대표가 온지음 집공방에 자문을 요청하면서 세 브랜드의 만남이 성사됐다. 언뜻 접점이 없어 보이는 조합이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한국의 미학에 진심이라는 것. 노스텔지어는 한옥 호텔을 통해 한옥을 우리 곁의 존재로 만들어왔고, 윤현상재는 2021년에는 전통 공예와 현대 공예를 연결하는 전시 <개물성무>, 지난해에는 밀라노 한국공예전 <사유의 두께>를 기획하며 한국 공예를 꾸준히 탐구해왔다. 온지음 집공방은 국내를 대표하는 한옥 연구소이자 설계 집단으로, 한국 건축과 생활 문화 전반을 연구하고 현재화하는 일을 한다. 업역은 다르지만 그리는 지점은 비슷했다. 그 접점을 바탕으로 한국 미학의 본질을 한옥에 구현하는 더블재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윤현상재가 공간 기획을, 온지음 집공방이 설계와 자문을 맡아 한옥을 더 한옥답게 만드는 일에 손을 보탰다.

방에서 바라다본 다도실. 문을 여닫는 방식에 따라 공간이 유연하게 변모한다.
1936년에 지은 더블재는 일자형과 ㄱ자형 한옥 두 채가 맞붙은 독특한 구조다. 서로 다른 두 채가 하나로 연결되며 한옥에서는 드물게 복도가 생긴 것이 이 집만의 특징(더블재라는 이름이 탄생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최주연 대표는 복도라는 이곳만의 매력을 살리고, 기단이 높아 어둡고 불편하던 단점을 개선하는 것부터 디자인을 풀어나갔다. ㄱ자형 한옥에는 주방과 다이닝 및 다도실과 거실을 배치해 퍼블릭한 역할을 부여하고, 복도 안쪽의 일자형 한옥은 방 세 개와 욕실을 두어 프라이빗하게 구성했다. 높은 기단은 낮출 수 있는 부분은 터내고 공간에 따라 몇 단계로 단차를 줬다. 그 결과 하나의 공간이지만 주방과 다이닝, 거실 바닥의 높이가 서로 달라졌는데, 덕분에 공간감이 한층 다채로워졌다. 단차가 수직적 경계 역할을 하면서 느슨하게 영역을 구분하는 장점도 생겼다. 복도보다 단이 낮은 거실은 소파와 테이블이 폭 파묻힌 듯 자리해 위요감을 만들어낸다. 단차는 온지음 집공방 박채원 소장이 더블재에서 특히 인상적이라 꼽은 부분이기도 하다. “한옥에서는 단차가 주는 매력이 굉장히 커요. 마당과 마루, 실의 높이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만들어내는 공간감이나 주고받는 시선의 차이가 한옥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예요. 요즘에는 바닥을 플랫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건축주가 많은데, 이곳은 그 단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너무 기뻤죠.”
본채에 최주연 대표의 확고한 방향성이 반영됐다면, 별채는 온지음 집공방의 자문이 내공을 발휘한 장소. 문지기방으로 쓰던 공간을 저쿠지로 계획했는데, 면적이 협소한 것이 못내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여기에 박채원 소장이 작은 난간과 툇마루를 제안해 추가로 공간을 확보했고, 그 결과 고즈넉한 사랑채가 탄생하게 됐다. 작은 타일을 둥글게 하나하나 붙인 저쿠지는 타일 회사로서 윤현상재의 정체성과 장인 정신까지 함께 보여준다.
기사 전문은 <행복> 6월호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E-매거진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