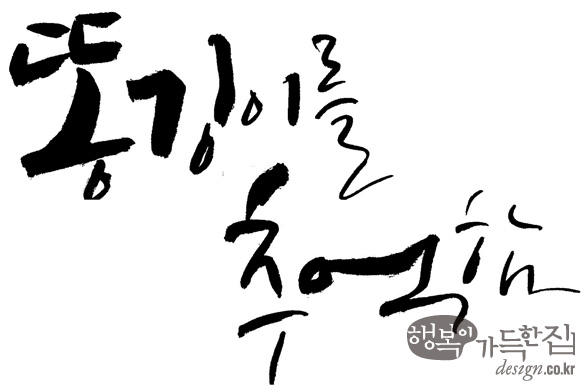
내 고향은 이제 ‘모던’해졌다. 섬의 동쪽 중산간에는 제주도의 키워드를 테마로 삼았다는 이타미 준의 공간들이 고사리처럼 피어 있고, 바다와 면한 동쪽 귀퉁이에는 마리오 보타의 아고라와 안도 다다오의 지니어스 로사이가 자리 잡고 있다. 역시 바다와 면한 서쪽 귀퉁이에는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고급 빌라가 서 있다. 현대 건축의 거장들이 빚은 건축물이 들과 바다에 화산재처럼 흩뿌려진 ‘모던’한 제주를 떠올릴 때, 그곳을 고향으로 둔 자의 소회는 양가적이다.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10대의 마지막을 넘기던 시절, 난 섬이라는 고립적 지형에 징글징글해하며 매일 계면 界面 너머를 꿈꾸고 술 마시다 잠들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토록 희망해 마지않던 고향 떠난 첫해, 쳇바퀴 도는 우울 앞에서 황망해했다. 이유는 하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때문이었다. 뭍의 정서는 난공불락이었다. 슈크림을 바른 듯 말랑한 기후와 그런 기후에서 양육된 ‘육지’ 친구들의 여리고 모던한 말투,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리의 애티튜드가 너무 낯설었다. 그러니 여름밤을 뒤척이게 만드는 소금기 머금은 해무 海霧의 기분 나쁜 끈적임, 훅이라도 한 방 맞은 것처럼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던 바닷바람, 마당을 반으로 갈라 비와 해를 동시에 뿌려대는 날씨의 변덕까지, 모두가 그리웠다.
그때였을 것이다. ‘세계적 관광지’라는 캐치프레이즈 뒤에 ‘촌스러운 인프라’라는 비난이 늘 따라붙던 섬의 가장자리를 매립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갔을 땐 이미 매립 공사가 시작된 후였다. 유년과 소년, 청년기의 기억을 나란히 줄 세워놓을 수 있던 탑동. 안개 자욱한 밤바다의 수평선을 환히 밝히던 집어등의 몽환적인 아오라, 여름 소나기 직후 표현할 길 없는 ‘푸른 청춘’의 빛깔로 변한 대양의 하늘, 썰물 때면 모습을 드러내던 현무암 사이로 날래게 모습을 감추던 ‘똥깅이’를 품고 있던 기억의 저장고 안으로 모래를 가득 실은 덤프트럭들이 몰려가고 있었다. 직접 손으로 만지고, 발로 디딜 수 있던 바다는 얼마 후 잘 닦인 콘크리트 아래로 모습을 감췄다.
섬의 날쌘 변화는 오랜 애인의 변심만큼이나 당황스러웠다. 이유야 어떻든 제주 시내를 가로지르던 하천들이 복개됐고, 일주도로 위쪽으로 골프장을 잇는 대로가 발 빠르게 들어서기 시작했다. 유년 시절의 기억 속을 걷다 보면 백중 백백 길이 좁아진 느낌이라고 말하지만, 내겐 정반대였다. 제주의 길들은 점점 더 넓어졌고, 복잡해졌다. 실핏줄 같은 중산간 길들의 오밀조밀한 묘미는 스피디한 대로의 스펙터클 앞에 잔뜩 주눅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 기이한 역설 앞에서 나는 수시로 길을 잃었다.
그러다 만난 섭지코지의 어느 여름날을 잊지 못한다. 김녕 앞바다에 드리운 낚싯대를 파도에 빼앗긴 뒤 산책이라도 할 겸 섭지코지로 향한 건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무렵이었다. 거세기로 유명한 섭지코지의 바람이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다. 바다를 향해 시선을 던지고 10분쯤 지났을까. 섬의 동쪽 바다 전체가 벌겋게 타오르기 시작하더니 언덕 위의 붉은 화산재까지 덩달아 컬러풀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홍염의 언덕! 장관이었다. 태풍 직전의 중문 앞바다에서 문충성 시인의 ‘제주 바다’라는 시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했을 때의 전율이 다시 밀려왔다. 섬은 바로 거기에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었다.
“있다가 없는 것/ 보이다 안 보이는 것/ 견딜 수 없네./ 모든 흔적은 상흔 傷痕이니/흐르고 변하는 것들이여/ 아프고 아픈 것들이여.” (정현종 시인의 시 ‘견딜 수 없네’ 중)
흐르고 변한 제주. 그러니까 ‘모던’해진 제주는 좋다가도 나쁘다. 인기 드라마를 기념한답시고 섭지코지에 성당 가건물이 올라갔을 때, 난 극단으로 분노했다. 반면 섬의 진면목에 예의를 갖춘 건축물이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살짝 안도했다. 그 와중에도 변함없이 잊히지 않는 대상이 있으니, 바로 매립되기 이전의 탑동 바다를 누비던 ‘똥깅이’였다. 해안가 모래펄에 사는, 잔털이 흉물스럽게 돋아 있는 게. 이 소박한 갑각류가 검은 현무암 사이를 한가로이 누비던 장면. 그 장면이 바로 내가 기억하는 온전한 제주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_글 문일완
 문일완 남성 잡지 <루엘 >의 편집장이다. 제주 출신으로 오름 사진가 고남수와 사촌 지간이다. 제주를 떠나온 지 아득하지만 누구보다 고향 소식에 밝고 애착도 남다르다. 이번 제주도 취재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제주 태생의 ‘서울 남자’ 문일완 씨
문일완 남성 잡지 <루엘 >의 편집장이다. 제주 출신으로 오름 사진가 고남수와 사촌 지간이다. 제주를 떠나온 지 아득하지만 누구보다 고향 소식에 밝고 애착도 남다르다. 이번 제주도 취재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제주 태생의 ‘서울 남자’ 문일완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