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1월 구부러진 것이 완전한 것이다 (문정희 시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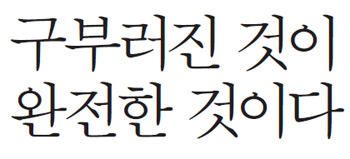 시인 문정희 씨의 두 번째 글
시인 문정희 씨의 두 번째 글
어느 가을날, 몇몇 시인과 함께 미당 선생님을 뵈러 갔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미당 선생님은 상당히 기분 좋게 취해 있었다.
인사를 드린 후 책장과 문갑 위에 놓인 백자 화병과 연적들을 조심스레 둘러보았다. 시인의 소장품들이라 값나가는 것들이라기보다는 단아한 태깔을 지닌 소박한 것들이었다.
특히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을 끈 것은 한쪽이 찌그러진 청화 매화 문양 향로였다. 그 향로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슬며시 안아보기까지 하자 미당 선생님은 특유의 미소와 느린 어조로 이렇게 물으셨다.
“그 향로가 왜 그렇게 좋으냐?”
“네, 찌그러진 것이 참 마음에 닿아요”
“그래, 너도 상당해졌구나! 곡즉전 曲則全이라 구부러진 것이 온전한 것이니라.”
그날 미당 선생님은 나에게 그 향로를 기꺼이 선물로 주셨다. 동행한 시인들의 부러움 속에 안고 온 향로 속에는 선생님이 시를 쓸 때 홀로 태운 침향 沈香의 검은 재도 정밀한 시간의 흔적처럼 소복이 담긴 채였다. 골동품 가치로는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었지만 지금껏 나는 그 향로를 인생의 비밀 부호처럼 간직하고 있다.
곡즉전이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나무도 강도 길도 곧장 뻗은 것보다 조금 굽은 것이 더 아름답고 영원하다는 뜻일 것이다.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잘 휘어진 노송 老松을 상상해보면 알 수 있다. 유연하고 겸허하게 온갖 장애물을 싸안고 흘러가는 강물 천 리를 그려보아도 알 수 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오솔길의 끝없는 정경을 상상해보아도 좋을 것 같다.
남을 제치고 빠른 속도로 곧바로 달려가서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많이 소비하며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요,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에게는 옷깃을 여미고 한 번쯤 음미해볼 만한 이치다.
미당은 침향을 좋아했다. 석가모니가 명상에 들 때 피운 백단향 白檀香도 좋아했지만 주로 침향을 피웠다. 침향은 산골짜기 물과 바닷물의 조류가 합수 合水하는 자리에 향기로운 나무 토막을 몇백 년 동안 담가두었다가 그것을 건져서 피우는 향으로 심청이처럼 물에 담근다 하여 한자로 심청이와 같은 글자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침향의 향기는 산과 바다 즉 산해 山海의 교향악이요, 옛사람들이 묻어둔 것을 오늘의 우리가 꺼내어 피우는 향이어서 오랜 영혼을 주고받는 혼교 魂交의 향이라고 미당은 말했다.
이기주의와 즉석이 판을 치는 요즘 세상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라 할 것이다.
곡즉전을 말하다 보니 언젠가 읽었던 수도회의 한 신부 이야기가 떠오른다. 신부는 천 일의 침묵 기도를 하겠다고 토굴로 들어간다. 긴 고행의 시간을 보내고 천 일에서 이틀쯤을 덜 채운 9백98일 만에 토굴을 나온다. 주위에서 안타까워하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천 날을 다 채우면 신 神과의 합일 合一을 이루었다는 오만에 빠질 것 같아 그만 묵언 默言을 풀었다”고 했다. 꼭 수행을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수행’에 붙잡히는 꼴이 되어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무언가를 꼭 이루겠다는 생각도, 사람 속에서 꼭 뛰어나겠다는 생각도 어설픈 강박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진지하게 휘어지고 아름답게 구부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진정한 완성이요, 자유로운 생명의 모습일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란 늘 불안한 미완성이다. 이 가련한 목숨을 욕망과 집착으로 얽어매고 대립과 편견으로 채우고 나면 고통스럽고 천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휘늘어진 매화 꽃가지를 새긴 향로를 다시 바라본다 바라본다. 저 향로를 빚은 조선의 도공은 어쩌면 다 빚은 후에 일부러 조금 찌그러뜨린 것은 아닐까. 3백 년 전에 물에 담근 침향을 오늘 꺼내어 피우듯이 곡즉전의 향로를 사이에 두고 문득 도공과 나 사이에 시간을 뛰어넘는 영혼이 교류하는 것 같아 오싹 전율이 인다.
“인간의 생명이란 늘 불안한 미완성”이라는 문장에서 마음에 모래바람이 일었습니다.
시는 원래 그런 것 아닌가요. 존재를 가엾이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 그 마음으로 시인은 노래합니다. 미완성인 인생이니 더더욱 ‘진지하게 휘어지고 아름답게 구부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완성을 향해 가자’고. 쉬워서 더 어려운 이 이야기 앞에서 한참 우두망찰해집니다.
얼마 전 문정희 선생이 펴낸 시집 <다산의 처녀>의 ‘처녀’야말로 진지하게 휘어지고 아름답게 구부러지면서 사는 존재일 것이라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시카다상’(동아시아 시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웨덴의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시집 들고 가을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