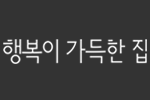- 2025년 11월 육아포비아를 넘어설 수 있을까
-
추석 연휴 동안 가족과 짧은 여행을 가기 위해 숙소를 알아봤다. 식구가 함께 묵을 방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연휴라 방이 없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정원’이었다. 요즘 대부분 숙소의 기준 인원은 서너 명, 많아야 다섯 명이다. 부모 둘에 아이 넷인 우리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방은 손에 꼽았다.
이런 불편을 숙소에서만 겪는 건 아니다. 식당에서도 다섯 명 이상 앉을 자리는 드물다. 한번은 아이들과 유명 어린이 시설에 갔는데, 가족을 묶어 할인하는 ‘가족권’ 대상이 부모 두 명과 아이 둘까지라 나머지 두 아이 비용을 따로 내야 했다. 세 자녀 이상 가족은 애초에 고려하지도 않은 듯했다.
출산 성적을 보면 이런 상황이 이해는 간다. 지난해 태어난 셋째 이상 아이는 전체 출생아 23만 8천3백명 중 6%(1만 6천3백명) 남짓이다. 내가 막내를 낳은 2018년에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3만 7백71명, 9.4%였는데 6년 사이 크게 줄었다.
사실 한국은 셋째는커녕 첫째도 안 낳는 나라다. 한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는 자녀 수)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0명대다. 20여 년 동안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 초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청년들과 인터뷰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 청년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관한 생각을 묻자 “무섭다” “감히 못 할 것 같다” “엄두가 안 난다”는 답이 돌아왔다. 외국의 청년들도 인터뷰해봤지만 육아가 “힘들다”고 하지, “무섭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었다.
비단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부모와 조부모 세대 역시 지금을 “예전보다 아이 키우기 더 힘든 세상”이라고 인지했다. “지금 키우라면 못 키우겠다” “내 아이는 자녀를 낳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세대를 불문하고 요즘 육아가 두렵고 더 어렵다는 인식, 즉 ‘육아포비아’가 만연했다.
육아가 어쩌다 두려운 일이 되었을까.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 자녀의 미래가 부모의 희생에 달렸다는 부담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 많은 부모가 이런 압박 속에서 ‘슈퍼 맘’ ‘슈퍼 대디’가 되어 살아간다. 청년들은 그런 부모의 삶을 보며 “나는 저렇게 살 엄두가 안 난다”고 부모 되기를 포기하고 있다.
육아포비아를 줄이려면 이 부모들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 부모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면서 육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은 짧고 유연하게 바뀌어야 한다. 정부 지원은 생애 전반에 걸쳐 끊기지 않고 촘촘하게 이어져야겠다. 그래야 부모가 육아의 모든 부담을 홀로 짊어진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 분위기다. 아이를 데리고 다녀도 눈치 보지 않는, 오히려 우대받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아이들이 사고를 친다고 ‘노 키즈 존’을 만들 게 아니라,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용 식기와 놀이 공간을 마련하는 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숭고한 삶의 과정이었다. 그런 육아가 ‘두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깝다. 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운 엄마로서 더욱 그렇다.
모두가 아이를 낳아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서워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그런 구성원이 다수인 사회는 분명 어딘가 잘못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동식물도 척박한 환경에 처하면 생식을 멈추지 않나. 출산율 0명대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지 보여주는 지표다.글 이미지(동아일보 기자, <육아포비아를 넘어서> 저자) | 담당 최혜경
이미지(동아일보 기자, <육아포비아를 넘어서> 저자)
이미지 기자는 17년간 사회부 기자로 일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출산·육아를 둘러싼 대한민국의 기이한 공포를 추적해왔습니다. 시민 35명의 취재와 집요한 인터뷰로 ‘공포가 공포를 낳는 현상’을 짚었습니다. 뜬구름 잡지 않는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하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물이 <육아포비아를 넘어서>라는 책이죠. 그리고 그 진심의 한 자락이 이번 호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에 담겼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자연 소멸할 거라는 나라에 사는, ‘가족’의 가치를 여전히 확신하는 <행복> 독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지 기자는 연세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다니던 중 동아일보에 합격해 17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부 차장을 맡고 있으며, 저출산 및 가족 문제 전문가를 지향합니다. 2018년부터 출산,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인구문제, 보육 현실, 사회 이슈 등을 다루는 칼럼 ‘포에버‘Four’ever 육아’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