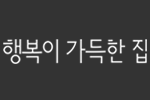- 2025년 10월 기후변화 시대의 행복
-
행복하기 위해 시도하는 몇 가지 노력이 있다. 우선 갈등을 부르는 말과 행동을 삼간다. 행복이 커지지 않지만, 누군가와 다투지 않는다면 으레 누릴 수 있는 평온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심사다. 다음으로 어지간하면 먼저 약속을 잡지 않는다. 즐거운 만남이든 아니든 에너지 소모가 심해 여파가 오래간다. 마지막으로 여유가 생기면 집 근처 산과 계곡을 걷는다. 나무와는 어떤 서먹함도 없고, 바람은 목소리가 크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은 우기는 법이 없다. 산책할 때면 애쓰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가볍고 즐겁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지 자기 방에서 조용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행복하기 위한 내 노력의 대부분은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화하려 하는 일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 생각할 때면 자연스레 집이라는 공간이 함께 떠오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의 집’은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니까. 그런 집을 아름답고 단정하고 아늑하게 꾸미려는 노력은 행복에 가까이 다가가는 수단 중 하나로 손색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 여름은 안팎으로 불행했다. 기후 열대화로 인해 집은 에어컨을 잠시만 꺼도 금세 후끈거렸고, 더군다나 빌라 꼭대기 층이라 밤에도 옥상 열기가 기승을 부렸다. 밖으로 나가는 건 어떤가. 산책은 수명을 단축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너무 뜨겁고 습해서 반건조 오징어가 되어가는 기분이랄까.. 그때 내가 꿈꾸던 집은 숲속에 자리 잡은, 천고가 높아 답답함이 덜하고 넓은 투명 창을 갖춰 주변 자연경관을 빨아들이는 별장 같은 공간이었다. 그 안에 있는 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집에 살더라도 마냥 즐거울 수 없다는 점이다.
넓은 투명 창과 높은 천고를 지닌 집은 쏟아지는 햇살과 넓은 부피 때문에 집 안을 식히거나 덥힐 때 일반 가정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어 아낌없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내 집은 쾌적하겠지만, 탄소 배출이 늘어나 지구는 더 망가진다. 혹서와 극한에 노출된 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피해도 증가한다. 나의 행복이 다른 이의 불행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행복한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지 자기 방에서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는 파스칼의 말은 타인과 관계없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좋든 싫든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서로를 고려해야 한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는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없지만, 선해질 수는 있다”라고 설파한다. ‘노력’으로 가능한 것을 우선으로 두자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버트런드 러셀은 이를 “선한 사람이라면 불행은 문제 될 것이 없는 척”해보자는 주장이라며 비꼰다. 선과 행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근래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빗물 재활용 시스템, ESS(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 건축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넓은 유리창과 높은 천고를 지닌 자신만의 집에서 행복을 누리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런 집의 골격을 이룬다. 선함과 행복함이 동시에 충족되는 어느 삶 중 하나는 손 닿지 않는 곳이 아니라 ‘나의 집’처럼 바로 우리 곁에 있다.
글 김기창(소설가) | 담당 최혜경김기창 (소설가)
“자기들만 살겠다는 게 다 같이 죽자는 말만큼이나 잔인한 결정이라는 걸 깨닫게 해줄 거예요.” (김기창 소설집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이 구절에 밑줄을 주욱 그었거나 멈칫했다면 그래도 선한 의지를 지닌 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인간 문명에 대한 절망에서 시작했다는 이 소설은 그래도 인간이 지닌 사랑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창 소설가는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습니다. 우리 질문에 그는 ‘선함과 행복은 공존할 수 있을까?’란 되물음을 보내왔습니다. 그 답은 9.9매의 글 속에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김기창 소설가는 1978년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 한양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이런저런 매체에 글을 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2014년 장편소설 <모나코>로 제38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으며 등단했습니다. 장편소설 <방콕>, 단편소설집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등을 통해 도시와 환경이 그 안의 인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인물들의 분투를 그려왔습니다. 최근 신작 장편소설 <화성의 판다>를 통해 인류가 존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9회 이호철통일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