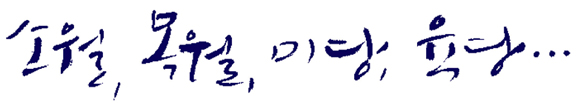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는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무존재는 무명 無名이다. 몸을 받아 태어나 개별자로 존재할 때 세상은 이름을 붙여 부른다. 이름을 갖기 전에는 하나의 사물이나 어둠에 지나지 않는다. 이름은 필연으로 다가오는 운명이다. 시인 김춘수는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꽃’)라고 노래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결코 무에 귀속될 수 없는/ 실재하는 그 무엇”(심보르스카, ‘가장 이상한 세 단어’), 즉 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동일한 것으로 세상에 나와서 저마다 다른 이름으로 산다. 이제 이름의 고유성, 개별성, 존귀성이 존재를 규정하고, 우리는 그 이름 속에 제 존재의 집을 짓는다. 이름은 영예의 기호가 되고, 오욕의 가시면류관이 되기도 한다.
호는 본명이나 자 이외에 달리 쓰는 이름이다. 본명이 아버지가 준 이름이라면 호는 본인이 선택하는 별칭이다. 당호・아호・별호라고도 하는 이 호를 처음 쓴 것은 중국 당대 唐代 사람들이다. 송대 宋代에도 그 관습이 이어지며 널리 퍼졌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호를 지어 썼다고 하니 호의 역사는 꽤 긴 편이다. 해방 이전 문인들은 대개 호를 썼고, 때로는 필명이 그 호를 대신하기도 했다. 제 의지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호는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자기가 되고자 하는 무의식의 아상 我相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호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취향, 품격이 드러난다.
일제강점기의 문예지 <문장>의 추천위원이던 시인 정지용은 박목월을 천거하며 “북에는 소월 素月, 남에는 목월 木月”이라 썼다. 소월이나 목월은 여성적 울림을 가졌다. 안서 김억이 재능을 발견한 소월의 본명은 김정식 金廷湜이다. 소월은 흰 달이다. 소월은 흰 달만큼이나 창백한 삶을 살다 불과 서른두 살에 스러졌다.
경주의 금융조합에서 서기를 하며 습작을 하던 청년은 목월이라는 필명으로 “내사 애달픈 꿈꾸는 사람/ 내사 어리석은 꿈꾸는 사람”(‘임’)이나 “송홧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에 귀 대고/ 엿듣고 있다”(‘윤사월’)같은 시를 썼다. 이 시들은 박영종보다는 목월이라는 필명과 더 잘 어울린다.
근대 문학가들은 거의 다 호나 필명을 썼는데, 스스로 호를 짓거나 남이 지어주는 것을 받아 쓰는 게 보통이었다. 이는 선비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한 잡지에 여러 글을 동시에 실을 때 중복을 피하는 방편이기도 했다. 신문화 초기에 필자란 筆者亂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현대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광수는 춘원 春園이라는 호를 썼다. 이광수는 그 밖에 장백산인, 고주 孤舟, 외배와 같은 필명을 쓰기도 했다. 고주나 외배는 어려서 양친 부모를 잃고 혼자 남은 저의 외로운 처지를 잘 말해준다. 김동인의 호는 금동 琴童이다. 말 그대로 거문고를 켜는 아이란 뜻이다. 예술 지향의 고아한 작가의 품성이 호에서도 드러난다. 한국 문학사에서 최고의 모더니스트로 평가받는 이상은 아예 성까지 바꾸었다. 이상 李箱의 본명은 김해경이다. 경성고공 건축과를 나와 조선총독부 소속 건축기사를 하던 시절 토목공사장의 인부들이 리상 李氏으로 불렀다. 이상은 그 잘못 불린 이름을 그대로 필명으로 삼았다. 이육사의 본명은 이활이다. 이활은 항일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에 가입해 활동한 사람으로 1927년에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피검되기도 했다. 1932년 베이징의 조선군관학교에 입교하여 이듬해에 제1기생으로 졸업했다. 1944년 베이징 감옥에서 마흔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다. 그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죄수 번호가 264였다고 한다. 그 수인 번호를 제 필명으로 삼았다. 육사 陸史란 호에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광야’)을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리라는 그의 기개와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최남선의 호는 육당 六堂이다. 최남선은 불과 17세의 나이에 출판사 신문관 新文館을 차리고 <소년>이란 잡지를 펴낸 사람이다. 천재의 조숙을 보여준 좋은 실례다. 최남선은 본명 외에 다른 이름이 18개나 있었는데, 대개 필명이나 익명으로 쓰기 위한 것이었다. 육당은 제가 만드는 잡지의 지면을 혼자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필명을 썼다. 그중에서 일반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육당이다. 오상순의 호는 공초 空超다. 공초에는 입신출세나 재물 따위에 연연하지 않고 철저한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 집과 아내와 자식과 장서 등 일체를 거부한 그의 견결한 의지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공초는 조계사 내의 선학원을 거처로 삼고, 오로지 시를 사랑하고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가 한 줌의 연기로 사라지는 담배를 유난히도 사랑한 것도 우연은 아니리라. 비우고 넘어서서 마침내 무의 세계로 귀의하려는 자의 호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찾기는 어렵다.
변영로의 호는 수주 樹州다. 수주는 변영로의 본적지인 경기도 부천의 신라 때 명칭이다. 본래는 형 변영만이 호로 썼던 것인데, 변영로가 형의 양해 아래 제 호로 삼았다. 집안 남자 전체가 일제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창씨개명을 거부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어떤 핍박도 그들 형제의 올곧은 성정을 꺾지는 못했다. “나는 눈물의 왕이로소이다”(‘나는 왕이로소이다’)라고 노래한 홍사용의 호는 노작 露雀이다. 홍사용은 일제의 탄압이 심할 때 소아 笑啞라는 호를 쓰며 벙어리를 자처했다. 노작이라는 호는 <백조> 동인으로 참여하며 쓰기 시작했다. 찬 이슬을 맞은 참새라는 뜻인데, 그 때문인지 단명했다.
한용운의 호는 만해 萬海다. 실은 용운이라는 이름은 절에서 쓰는 법명이다. 그의 본명은 유천이고, 만해는 법호다. 염상섭의 호는 횡보 橫步다. 염상섭은 명월관이라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이 호를 얻었다. 한 화가가 부채에 게를 그리자 동료 기자인 주종건이 “남들이 가는 길은 굳이 피하고 게처럼 옆으로만 가니 횡보가 어떤가” 하고 권했다. 염상섭은 호쾌하게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술을 유난히 좋아해서 취하면 갈지 之자 걸음을 하니, 옆으로 걷다라는 뜻의 횡보는 그와 잘 어울린다. 서정주의 호는 미당 未堂이다. 첫 시집 <화사집>을 낼 때의 호는 궁발 窮髮이었다. 이 호는 <장자외편 莊子外篇>에 나오는 풀도 차마 못 나는 곳에서 유래했다. 서정주는 해방 뒤에 이 궁발을 땅에 묻고 늘 소년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미당이라는 호를 지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다”(‘행복’)라고 노래한 유치환의 호는 청마 靑馬다. 유치환의 아명은 돌메다. 돌처럼 단단하고 산처럼 여물어서 오래 살라는 뜻으로 그렇게 불렀다. 유치환은 1939년에 <청마시초 靑馬詩抄>를 청색지사란 출판사에 펴내며 제 호를 세상에 알렸다. 푸른 말이란 뜻을 가진 청마는 낭만적이고 풋풋한 사람이다. 해방 직후 통영여중에서 함께 교편을 잡고 있던 시조 시인 이영도와 청마의 연애는 그토록 풋풋하고 낭만적인 것이었다. 청마는 이영도를 만나려고 야윈 당나귀를 타고 수백 리를 오고 갔다. 만나서 저녁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는 게 다였지만 청마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김현승의 호는 다형 茶兄이다. 김현승은 커피를 좋아한다 해서 다형이라는 호를 얻었다. 그는 커피에 대한 미각을 유지하기 위해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다. 대개는 집에서 커피를 끓여 마셨다. 그의 지독한 커피 사랑은 호에서도 숨김없이 드러난다.
김동리의 본명은 시종이다. 김영랑의 본명은 윤식이다. 고은의 본명은 고은태다. 김지하의 본명은 김영일이다. 황지우의 본명은 황재우다. 김현의 본명은 김광남이다. 정과리의 본명은 정명교다. 그들은 왜 본명 대신 필명을 만들어 썼을까? 필명은 그 본질에서 저를 감추는 익명 匿名이다. 저를 감춤으로써 글쓰기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요즘 문인들은 호나 필명을 거의 쓰지 않는다. 요즘은 본명을 쓰는 게 큰 흐름이다. 김훈은 김훈이고, 은희경은 은희경이고, 김영하는 김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