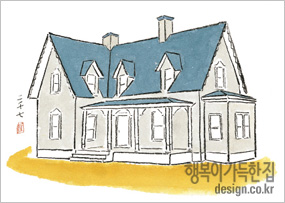 “집 앞에 슈퍼마켓도 없고 제과점도 없는데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두 아들 녀석이 아우성을 쳤다. 전원생활을 결행할 때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교육 문제였다. 하지만 우린 최고의 가치를 위해 그 밖의 모든 건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다. 이건 정답이 없다. 가치관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 가족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서둘러 도시를 떠났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위대한 어머니, 흙의 경이로움을 알게 하는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다만 땅을 구할 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 두 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했다. 그 배려란 집에서 큰 도로까지 1km이내여야 하고, 하교 후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다. 다행스럽게도 구미에 딱 맞는 땅을 구할 수 있었다. 논산 시내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너무 외지지 않은 데다 버스 정거장도 5백m 거리에 있었다. 게다가 자동차로 20분이면 학교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논산시 연산면의 황토밭 5백 평을 점찍은 건 2005년 가을쯤이었다.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조금만 보태면 땅과 집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왔다. 우리는 매끈하게 집을 잘 짓는 것보다 좋은 땅에 투자를 했다. 좋은 대지라야 미래 가치가 있다는 계산이었다.
“집 앞에 슈퍼마켓도 없고 제과점도 없는데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두 아들 녀석이 아우성을 쳤다. 전원생활을 결행할 때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교육 문제였다. 하지만 우린 최고의 가치를 위해 그 밖의 모든 건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다. 이건 정답이 없다. 가치관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 가족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서둘러 도시를 떠났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위대한 어머니, 흙의 경이로움을 알게 하는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다만 땅을 구할 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 두 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를 했다. 그 배려란 집에서 큰 도로까지 1km이내여야 하고, 하교 후 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다. 다행스럽게도 구미에 딱 맞는 땅을 구할 수 있었다. 논산 시내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너무 외지지 않은 데다 버스 정거장도 5백m 거리에 있었다. 게다가 자동차로 20분이면 학교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논산시 연산면의 황토밭 5백 평을 점찍은 건 2005년 가을쯤이었다.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조금만 보태면 땅과 집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왔다. 우리는 매끈하게 집을 잘 짓는 것보다 좋은 땅에 투자를 했다. 좋은 대지라야 미래 가치가 있다는 계산이었다. 땅을 고를 땐 풍수지리학을 참고했다. 인공위성으로 집 마당까지 손바닥 보듯 하는 세상에 무슨 풍수지리냐고? 풍수지리는 대자연의 기운과 인간의 조화를 꾀하는 매우 과학적인 학문이라는 걸 집을 지으며 알게 됐다. 보통 ‘인적이 드문 산속 또는 강이나 호수가 잘 보이는 높은 곳’을 좋은 터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이중환의 <택리지>에 이런 글이 나온다.”좋은 터는 비산비야非山非野에 있다. ”말 그대로 ‘산도 아니고 들판도 아닌 곳’이다. 훌륭한 인물이 태어난 ‘OOO 생가’에 가보면 이 말이 실감 난다. 조상님들은 집터를 잡을 때 반드시 산을 뒤로했다. 이건 산중턱에 지은 것이 아니라 산이 내려와 평지와 만나는 지점을 말한다. 조상님들은 되도록 낮은 곳에 집을 지었다. 풍수지리를 따지지 않아도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이 정서적으로 편안하다. 지대가 낮고 앞을 막아주는 산이 있는 터가 집터로 좋다. 땅을 고를 때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다. 집을 지으면서 고민한 것 중 하나가 ‘방은 몇 개로 하고 면적은 몇 평으로 할 것인가?’였다. 네 식구가 사는데 안방과 아이들 방 그리고 서재 하나에 손님용 사랑방 하나. 이렇게 방 4칸, 35평으로 짓기로 했다(물론 건축비를 감안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짓고 생활해보니 35평은 꽤 큰 면적이다. 아파트 면적으로 치면 45평 정도는 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사람이 사는 데 가장 쾌적한 평수는 5평이라고 한다. 4인 가족일 경우 25평이면 딱 맞는 면적이다. 이들의 조언을 따랐으면 건축비도 줄이고 아담한 집을 지었을 거라는 후회를 뒤늦게 했다. 집은 한옥 기와를 얹은 목조구조의 한옥을 본땄다. 단열이나 공간 쓰임새를 생각해서 내부 구조는 일반 아파트 구조와 같게 했다.
집은 한옥 기와를 얹은 목조구조의 한옥을 본땄다. 단열이나 공간 쓰임새를 생각해서 내부 구조는 일반 아파트 구조와 같게 했다.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한옥을 적극 권하고 싶다. 1년 정도 살아보니 한옥이야말로 ‘친환경’ 주택이다. 건축 재료의 대부분은 나무와 흙이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단열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따뜻하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정이 가는 집이다. 요즈음 전원주택으로 가장 사랑받는 게 목조주택인데, 이것도 평당 3백만~4백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목조주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싫증이 난다는 게 목조주택에서 오래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다. 차라리 평수를 좀 줄여서 한옥을 짓는 게 낫다는 실속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누구나 한 번씩 한옥을 꿈꾸지만 건축비가 비싸다고 망설이는데, 요즘엔 목공 기계가 발달해 나무 다루는 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옥 건축비도 낮아졌다. 내가 아는(문화재청에 등록된) 한옥 목수는 3백 50만~6백만 원 정도면 멋진 한옥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한다. 국산 소나무 대신 구하기 쉬운 수입 소나무를 쓰면 건축비는 더 내려간다(물론 국산 소나무가 최고지만, 좋은 수입 소나무도 많이 있다). 그런데 수입산 소나무를 쓸 때는 어느 지역의 어떤 소나무인가를 살펴야 한다. 캐나다와 같이 북반구에서 자란 소나무와 뉴질랜드와 같이 남반구에서 자란 소나무는 인장력과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더운 지방의 소나무는 빨리 자랐기 때문에 힘을 받는 건축자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한옥 목수들의 견해다. 한옥을 제대로 짓는 목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조금만 수소문하면 좋은 목수들을 만날 수 있다. 한옥을 제대로 짓는 목수는 ‘도판’이라고 하는 설계도를 상담하는 현장에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1년이 지난 지금, 보름날 저녁이면 앞산을 훤하게 비추는 큰 달덩이에 온 식구가 감탄한다. 서울의 달은 달도 아닌 것 같다. 대나무 숲에 사는 산까치 소리에 아침잠을 깬다. 아이들은 “아빠, 우리 집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인지 몰랐어” 하며 즐거워한다. 우리 가족은 확실히 인간답게,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 행복만큼 불편도 있다.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면 먼저, 이 세상엔 인간과 자연(동식물)이 공존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한번은 보일러가 고장 나서 서비스 신청을 했는데, 고장의 주범이 바로 쥐였다. 땅속에 묻힌 보일러 전선을 쥐가 갉아서 선이 끊어진 것. 게다가 이사 와서 보니 이 마을엔 개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새벽이고 밤이고 개들이 컹컹거리고, 냄새 또한 지독해서 숨 쉬기조차 불편할 때가 있다. 개 주인들에게 항의하기도 어렵다. 돼지나 소, 닭은 가축으로 분류돼 냄새와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지만, 가축이 아닌 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단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9월부터 개도 가축으로 분류돼 법적 규제가 따른다). 한여름 밤 사력을 다해 불빛으로 돌진하는 모기와 하루살이, 나방과의 전쟁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게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원생활을 꿈조차 꾸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벌레들과의 전쟁을 우리 아이들은 산 교육으로 받아들인다. 둘째 아들은 여름이 오면 밤이 기다려진단다. “이건 노린재고, 저건 배추나방이야.” 자연도감을 읊으며 으쓱거린다.
전원생활은 꿈의 낙원이 아니다. 흙 묻은 구두가 괴로울 수도, 벌레가 끔찍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권리도, 능력도 없다. 인간은 자연과 공존해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야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권리가 없다는 건 전원생활이 준 가장 큰 가르침이다.







